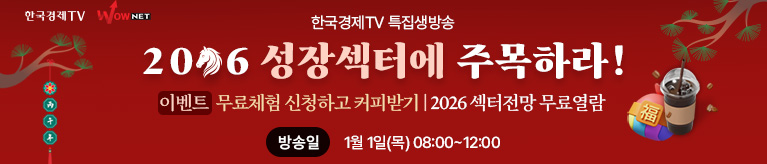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공룡부처로 거듭나면서 나타난 `관치금융` 비판뿐 아니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두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대선을 앞두고 수면위로 떠오른 금융감독 개편론의 핵심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급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평가도, 개편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기능의 성격이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전성인 홍대 경제학과 교수: 편리성 때문에 감독 기준 완화하는 것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 건전성을 위해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산업정책적 목표 때문에 가속페달을 밟는... ]
때문에 금융위가 경기활성화 정책 기조를 보다 중시하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금융사고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조원이 증발한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치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건도 없던 펀드 환매 연기 중단은 2018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규제 완화 이후 설정된 부실한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환매중단이 대거 발생한 겁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감독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감원의 감독 집행 권한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렇다보니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위 산하 기구로 위상이 낮아졌고, 감독 기능이 정책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 개편론이 학계와 정치권, 대선 캠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 방향에 대한 주장이 제각각인데다 자칫 규제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업계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