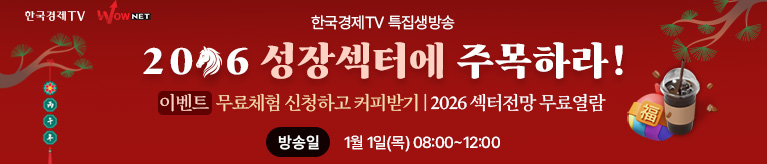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진상파악을 위한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확보하고도 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한 행정처 심의관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컴퓨터 저장장치 내 문서파일 등을 복구하거나 열어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6일 "조사위는 여전히 조사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며 추후 일정도 전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조사위가 구성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본격적인 물증 조사는커녕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내 저장장치에 접근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처 심의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컴퓨터 내 파일을 열 경우 형법 위반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형법 316조는 잠금장치가 돼 있는 저장매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해제해 내용을 확인하면 `비밀침해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가 공적인 업무에 사용된 만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자칫 불필요한 내부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라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또 실제 블랙리스트 파일이 발견될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고려해 법적 하자가 없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가 더뎌지면서 당초 이달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조사결과가 해를 넘겨야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사법제도 개혁에 전념하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일선 법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판사회의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하게 해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취임한 이후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지난달 3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