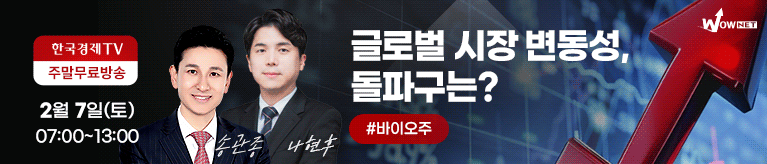새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극도의 내홍을 겪고 있다.

유엔본부에서 일하는 6,600명가량의 전체 직원들이 현재 사용하는 지정석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무실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른바 `열린공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유엔본부에서 일하는 전체 임직원 가운데 국장 이상 소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의 지정석이 사라지는 것.
현재 유엔 직원의 사무실은 모두 지정석인데다 옆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번 새 방침에 따라 38층 높이의 유엔본부 건물 내 극히 일부 층의 임원들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 사무실은 칸막이가 사라지고 책상만 한데 모아 배열한 형태로 재배치된다.
먼저 출근한 사람이 아무 자리나 골라 앉을 수 있다.
유엔의 이런 방침은 살인적 사무실 임대료로 유명한 뉴욕 맨해튼에서 적잖은 직원들이 본부에 사무 공간이 없어
외부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는 재정적 부담 때문이다.
반면에, 본부 내 상당수 자리는 직원들의 출장, 자리 이탈 등으로 비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열린공간 제도를 통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본부로 불러들여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문제는 이번 방침에 직원들의 반발이 몹시 거세다는 것으로 업무 속성상 잦은 회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아무 자리에 앉다 보면 회의 소집이 어려워진다는 어려움이 있다.
열린공간 방식은 실증적 차원에서 효율성이 없어 서서히 `한물갔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지정석이 사라지면 업무와 관련된 각종 기밀문서를 보관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자리가 없어지는 것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가 영업사원이냐"는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반 총장 취임 이후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연거푸 4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반 총장이 퇴임 1년여를 앞두고
업적 쌓기에만 골몰한 나머지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열린 공간`과 같은 논란이 불거진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