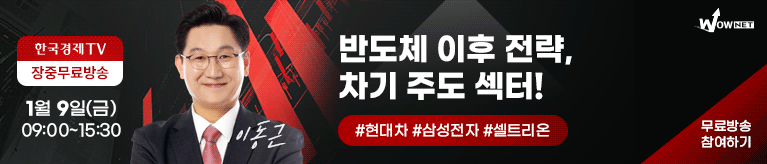|
| ▲ 몰도바 국기(자료사진 = 한경DB) |
IMF가 한창이던 1998년 여름.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로 가는 길에 다뉴브강을 건넜다. 양쪽 강변에는 각국의 세관이 있었고 여행자들은 배로 국경을 건넜다. 그때 배삯으로 지불했던 돈이 미화 50센트, 우리 돈 500원이었다. 부다페스트에서 브라티슬라바로 가는데 사용된 전체 여행금액은 ‘달랑’ 4.5달러 정도였다.
‘500원으로 국경 넘기’는 2007년 데일리서프라이즈를 통해 연재된 기존 원고를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게재하는 코너다. 이기호 기자의 독특한 여행담을 소개하는 코너다. 몰도바, 터키-그리스, 헝가리-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한국의 독도 그리고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따라나섰던 멕시코-코스타리카-미국 등 총 7차례의 여행경험을 매주 토-일요일 연재하며 분량은 여행지별로 차이가 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색다른 여유를 느껴보자.(편집자)
1997년 10월 1일, 동유럽의 작은 나라 몰도바(Moldova, Moldavia라고 하기도 한다)에 들어갔다가 만10개월을 체류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미국 켄터키에서 약 3개월을 체류한 뒤 시카고를 거쳐 대서양을 건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오른 나는 괜히 추운 날씨를 예감했다. 몰도바가 1991년 8월 27일 독립선언 이전까지 소련연방의 속해있었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탑승한 몰도바항공(Air Moldova)의 국제선 비행기는 우리나라의 국내선 비행기만도 못했다. 안전벨트는 있었지만 등받이가 앞으로 접혀지는 특이한 좌석이었고 두께도 일반 승합차의 좌석보다도 훨씬 얇은 ‘간이의자’ 같은 좌석이었다. 비행시간이 짧아 기내식은 없었고 음료도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의 간단한 주스만 나왔다. 맛이 독특했다.
여성승무원은 예뻤지만 복색이 남루했고, 줄나간 스타킹이 눈에 띈다. 더 생소한 건 비행기 창밖에 펼쳐진 프랑크푸르트와 키시네프(Kishinev)의 차이였다. 현대화 수준도 달랐지만 훨씬 북쪽의 프랑크푸르트가 아직 여름이었던데 반해 한참 남쪽의 키시네프는 이미 털모자를 쓴 겨울이었다. 미국에서 반팔로 지냈던 나도 14시간 만에 겨울복장으로 바뀐 상태였다.
 |
| ▲ 1997년 무렵 몰도바의 수도 키시네프의 번화가(사진 = 이기호) |
날은 이미 어둑해지고 비행기에서 내린 몇 안 되는 승객들이 합판으로 만든 조잡한 통과대에 줄을 섰다. 나도 그들을 따라 줄을 섰다. 알고 보니 비자를 발급받는 곳이었다. 미국에서 비자를 받았던 나는 설마 그곳에서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더 재미있는 건 간단한 확인 이후 별다른 검색 없이 세관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뭔가 허전했다.
키시네프, 70년대 서울을 떠올리게 하는 도심풍경
공항 밖에는 2명의 현지인이 마중 나와 있었다. 80년대 초반까지 서울에서 볼 수 있었던 브리샤, 제미니 같은 러시아제 소형 승용차 라다(Lada)를 타고 키시네프를 가로질렀다. 가로등이 있긴 했지만 대충 봐도 70년대 서울 거리를 보는듯했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어린 시절이 떠올라 괜히 푸근해진 느낌이었다.
키시네프의 한 가정에서 첫 밤을 묵게 됐다. 과거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국가의 주택은 공통점이 있다. 회색 건물에 흰색으로 페인트칠이 된 나무 창틀과 창문이 달린 흰색 문짝들, 그리고 커튼과 식탁 등을 수놓은 장식이다. 스프와 빵으로 간단히 요기를 한 뒤 나를 안내한 일행 중 한 명인 조지(George)가 “몰도바 여성들, 정말 예쁘지 않느냐”고 묻는다.
영어를 좀 한다 싶었다. 그는 내 통역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아로서 몰도바인의 자국민 칭송을 고분고분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 게다가 마침 밤에 도착한 키시네프 거리의 어둑한 가로등 아래서 여자들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음~ 글쎄, 나는 한국여자들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설마’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재차 “그동안 27개국을 다녀봤는데, 그중 몰도바여성들이 가장 예뻤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몇 나라를 다녀보지 못한 처지에서 상대할 입장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현지인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사실 바깥이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
| ▲ 포도주가 주요 농산품인 몰도바의 전형적인 풍경(사진 = 이기호) |
동유럽의 가을을 압도한 몰도바 여대생들의 미모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내가 머물게 될 코우셴(Causeni)으로 떠나기 전 잠시 시간이 남아 키시네프 거리로 나섰다. 인구 70만의 조그만 수도였지만 나름대로 밝고 활기찬 도시였다. 어느 모퉁이를 돌아서자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찌나 늘씬한지 잠시 모델스쿨로 착각할 정도였다. 알고 보니 그냥 평범한 대학교였다.
어제 밤 27개국을 다니며 확인했다는 조지의 말이 ‘급’ 이해되기 시작한다. 3개월간 미국에서 맥도널드로 덩치를 키운 여성들만 보다가 날씬한 여성들을 보니 실제보다 약간 과장되게 인식된 측면도 있었겠지만 정말 인물들이 좋았다. 또 나중에 느낀 점이지만 여성들의 미적 과시는 과거 소련연방이었던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경향 중 하나이기도 했다.
조지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몇 달 뒤에 알게 됐다. 루마니아 출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정통 뉴요커로 몰도바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 결국 그의 몰도바여성 칭송은 나름의 국제적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20대 젊은 여성들이 예쁜데 반해 30대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래서인지 조지는 그때까지 총각이었다.
잠시 둘러본 키시네프는 공원과 호수가 많은 평온한 도시로 제2차 세계대전 피해 이후 많이 복구된 상태였다. 스탈린 시대에 건축된 잿빛 건물과 돔형태의 지붕을 갖춘 정교회 건물이 많았고 도시 곳곳에서 동유럽 특유의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길게 감상할 여유는 없다. 라다를 타고 키시네프를 벗어나자 이내 좁은 비포장도로가 이어진다. 이젠 코우셴과 몰도바 안의 ‘다른 나라’ 트랜스드니에스트르(Transdniestr)를 경험할 차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