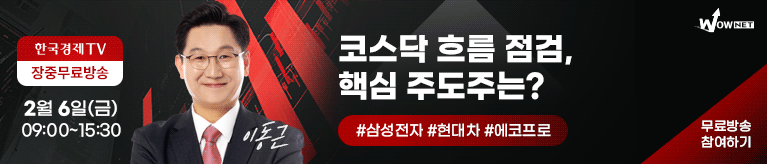기술이나 지적재산만 있으면 담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기술금융은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창조금융의 핵심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어제(7일) 시중은행 중 기술금융 실적이 좋은 지점을 방문해 “기술금융은 일석삼조의 금융”이라면서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격려 방문’이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은행권에 대한 기술금융 실적 압박인 셈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부실대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기업(1.30%)의 연체율이 대기업(0.74%)의 두 배에 달했고 한 달 동안의 상승폭(0.16%)도 대기업을 능가했습니다.
정부의 기술금융 추진에 맞게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스쳐 지나갔던 녹색금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 금융권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은행의 경쟁적인 녹색금융 대출이 중복 투자로 이어졌고 경기 부진과 겹치면서 금융권의 대출 부실로 이어졌다”며 “기술금융에 대한 은행들의 양적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녹색금융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실적을 매월 보고하게 하고 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관치금융 철폐’를 외치는 정부의 행보와 대치되는 데다가 자칫 대출의 양적 경쟁을 유도해 부실대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은행도 맞춰 나가면서 대출 건전성도 신경쓰면서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은행권 과다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기술금융 실적이 낮은 일부 은행들이 기술금융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기술 관련 제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기술금융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양적 평가보다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관점에서 기술금융을 적용한 다양한 기법과 효과, 기여도, 기술력 평가 능력의 개선 수준 등 질적 평가에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