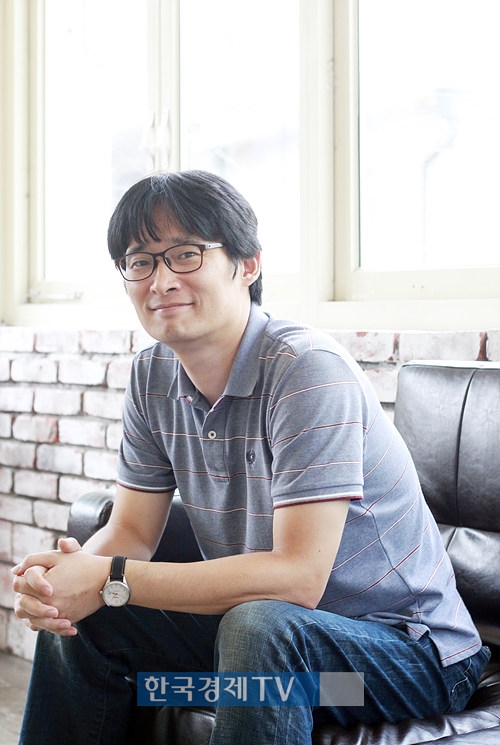
6일 개봉된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 전 고래의 습격을 받아 국새가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찾는 해적과 산적, 그리고 개국세력이 벌이는 바다 위 통쾌한 대격전을 그린 어드벤처다. ‘해적’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국새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모인 해적단, 산적단, 개국 세력이 만들어가는 시너지. 김남길 손예진 유해진 김태우를 비롯해 1994년생 설리부터 1960년생 이경영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멀티캐스팅이 극의 활력을 더한다.
- 귀신 고래 컴퓨터 그래픽(CG)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CG팀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거의 촬영장에서 동고동락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를 자청해서 일을 했다. 이런 영화에서는 그린 스크린이 중요한데 보통 촬영 조명 팀에서 설치를 맡는다. 그린 스크린이 크기 때문에 기중기로 설치를 하는데, 몇 사람이 밧줄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CG팀이 많이 도왔다. 그냥 알바를 써도 됐지만 CG팀에서 제작 환경을 보며 배우는 게 많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해야 되나? 후반 작업에서 어떤 것에 대해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대답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촬영 현장을 지켜보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니 내가 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주더라. 그래서 제대로 된 작업이 된 것 같다.”
- CG가 많기 때문에 디렉션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다. 보통의 영화는 이렇게 촬영을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감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적’은 절반 이상이 CG 작업이다 보니 결과물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촬영감독, CG슈퍼바이저 분들과 의견 교환을 많이 했다. 어떤 부분이 엇나가게 되면 그 컷을 아예 쓸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졌다. 내가 봤을 때는 OK 컷인데도 많은 이들에게 물어봤다. 그러다보니 배우들이 답답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 좋고 아님을 바로바로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점차 적응해나가서 감사했다.”
- 김남길과 손예진의 캐스팅은 조금 의외였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정 역할에 김남길 씨를 추천했다. 그런데 전작들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김남길 씨의 이미지와 전혀 매치가 안 되더라. 그런데 연기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있었다. 당연히 불안하기도 했다. 모험이 아닐까. 하지만 만나보니 느낌이 오더라. 사람들과 두루 친해지고 밥도 같이 먹고. 제작사에도 자주 찾아오고. 결정된 다음에도 확신은 없었다. 어떤 배우였어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촬영에 들어가면서 모든 걱정이 없어졌다. 오히려 많이 망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말리기도 했었다. 여배우 캐스팅도 힘들었다. 사극이나 액션을 잘하는 배우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손예진 씨가 시나리오를 좋게 봤다고 하더라. 그러나 본인도 선뜻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적’에 많은 관심을 쏟는 배우였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우리가 설득을 했다.”
- 결론적으로는 김남길 손예진 콤비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친하지 않은 배우들이 했으면 잘 살지 않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미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추지 않았나. 사실 두 사람이 붙는 장면은 많이 없다. 그래서 모르는 두 배우가 했다면 뭔가 어색했을 것 같다. 친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애드리브도 꽤 있다. 두 사람은 촬영장에서도 아옹다옹한다. 현장에서 김남길 씨가 손예진 씨에게 ‘부인’이라는 호칭을 쓰더라. 애교가 참 많다. 그런데 손예진 씨는 그러든 말든 들은 척도 안한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재미있었다.”

- 다른 이야기인데, 감독님은 코미디와는 전혀 안 어울리는 진지한 성격이다.
“선입견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 데뷔를 할 때도 ‘너 같은 사람이 연출을 잘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 감독이 유쾌하다고 해서 배우들이 유쾌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웃음의 감각이라는 건 대중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자기만의 독특한 웃음 코드를 가지는 감독이 있는가하면, 대중들이 원하는 눈높이를 만드는 감독이 있지 않나. 그게 중요한 것 같다. 난 벌써 코미디에 익숙해져서 그런 장면들이 별로 없는 장면을 찍을 때는 조금 불안하다. 유쾌하거나 코믹함이 없는 장면을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도 되나’라는 불안감이 오기도 한다. 하지만 100신이면 100신 다 웃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쥐었다 폈다 하는 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장면은 최대한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관객들의 취향에 맞는 소소한 웃음 역시 최대한 많이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 버릴 캐릭터가 없을 정도로 그 힘이 대단했다.
“한 번 등장한 캐릭터는 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작은 역할이라고 할지라도 연기를 잘하는 사람과 하고 싶다. 작은 배역이라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연기를 하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역할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의미가 있는 배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다. 캐릭터는 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웃기고 없어지면 안 된다. 합리적으로 마무리를 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캐릭터와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에 대한 예의이며 관객들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다.”
-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해적이냐 산적이냐.
“처음에는 영화 제목이 ‘해적: 귀신 고래를 찾아서’였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바다로 귀신 고래를 잡으러 가는 산적들의 비중도 꽤 크다. 해적 쪽으로만 강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부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다. 어떻게 보면 ‘해적: 산적’ 이게 맞지 않나. (웃음) 그러다 ‘바다로 간 산적’이 나왔다. 코믹한 맛도 있고, 고래를 전면에 내세우는 부담감도 조금 가라앉는 듯 했다. 귀신 고래의 CG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이 집중되는데, 고래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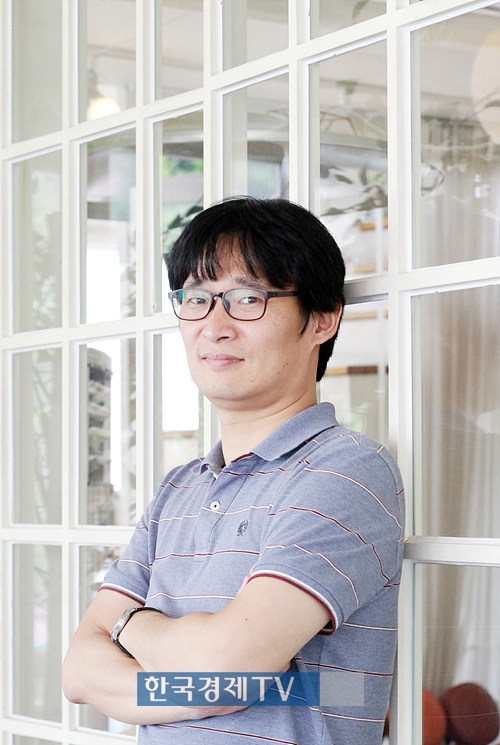
한국경제TV 최민지 기자
min@blue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