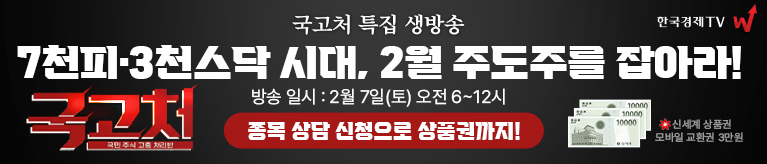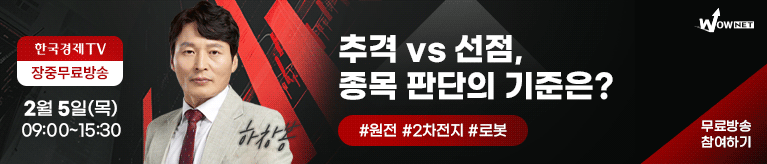■ 쓰레기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마야문명을 간직한 나라, 온두라스. 그러나 빈곤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 70%이상이 가난에 허덕이며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의 외곽에 위치한 한 쓰레기장에는 매일 아침이면 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바로 고철을 주워 되팔기위해서다.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에게는 쓰레기장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살아갈 돈이 없어서 여기서 일해서 먹고 살아요.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요”-미첼 곤잘레스, 13세
충격적인 것은 쓰레기장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7세~13세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같이 쓰레기를 줍고 있다는 것이다. 생계를 잇기 위해 학교가 아닌 쓰레기장으로 출근하는 아이들. 하루종일 쓰레기장에서 값나가는 구리를 찾기 위해 땡볕아래에서 일하고 끼니 역시 쓰레기더미에서 나온 썩어가는 과일과 채소를 주워 먹고 이마저도 구하지 못하면 굶는 수밖에 많다. 그러나 이렇게 일해서 버는 소득은 하루에 고작 1~2달러(약 2,500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일해서 번 돈으로 엄마에게 음식을 사 드리고 옷이랑 신발도 사고 못 듣는 동생에겐 보청기를 사줄 거예요.“-브라얀 이바라모, 10세

■ 살기 위해, 학교를 나와 거리로 나선 아이들
온두라스에서는 약 2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돈을 벌기위해 일하고 있다. 경찰이 꿈이라고 말하는 8살 브라얀도 4명의 동생들과 함께 매일 쓰레기장으로 간다. 변변한 안전장비도 없이 일하는 아이들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다. 맨손으로 일하다 날카로운 금속이나 주사기에 찔리고 값나가는 구리를 찾기 위해 쓰레기를 태우다 생긴 메탄가스를 들이마시며 일하고 있다.
“아이들이 집을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이들을 내몬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끌라리 산체스, 온두라스 아동복지센터 ‘연대의 집’
그러나 아이들은 계속해서 쓰레기를 줍는다.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온두라스 아이들은 60%가 진학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 일을 하거나 길거리로 나간다.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은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3월, 23세 미만의 청소년 93명이 살해당했고 20세 미만 소녀 중 24%는 임신한 상태다. 가난에 쫓겨 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온두라스의 아이들을 `세계는 지금`이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