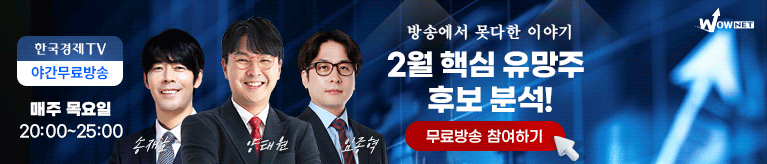명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 A는 한때 ‘가격 기습 인상’으로 유명세를 탔다. 당시 나는 5월 1일부터 A 브랜드가 가격을 10퍼센트 이상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자에게 맞는다는 걸 확인하고(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격 인상 얘기는 기자가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 먼저 해주지 않는다) 4월 말에 기사를 썼다.
길지 않은 기사였지만 그 기사가 나간 뒤 5월 1일이 되기 전에 사재기를 하려는 여성들이 매장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10퍼센트라고 하면 감이 안 오겠지만 몇백~몇천만 원짜리 명품인지라 10퍼센트면 상당한 액수가 된다. 게다가 그때가 혼수 시즌이었기에 당장 제품이 없으면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서라도 미리 결제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5월 중순께 그 브랜드의 홍보팀 임원을 만나게 됐다. 점심을 먹으며 그분은 “그 기사 때문에 4월 말에 매출 그래프가 갑자기 뛰었어요. 월 매출 최고치를 경신했다니까요”라고 했다. 나는 당연히 좋았겠다 싶어 “본사에서도 좋아했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올랐는지 묻지 않던가요?”라고 웃으며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좋기는요, 당장 이번 달 매출이 그만큼 안 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는걸요. 최고치를 경신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거든요. 매출 그래프가 들쭉날쭉한 것보다는 마이너스 보지 않고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이어진 그분의 얘기는 더 충격적이었다. “근데 일간지에서는 명품 브랜드 한 곳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기삿거린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명품 가격 인상에 민감한 나라도 없을 거예요. 고작해야 3퍼센트, 많아야 10퍼센트 안쪽으로 올리는 건데 그걸 기사로 쓰고 그 기사를 보고 줄을 서서 사재기를 하다니,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A 브랜드의 홍보 임원이 그런 질문을 던진 배경에는 자사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명품을 소비하는 계층, 즉 그 브랜드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고객은 가격 좀 올리고 내리는 데 신경 쓰지 않는, 그야말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정말 돈 있는 명품 소비층은 몇십만 원 오른다고 해서 그것 좀 싸게 사자고 사람들 많은 명품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 일간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언론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었다. 월간지인 패션 잡지들이 그들의 주요 타깃인 이유는 첫째, 주 소비층인 여성들이 독자이고 둘째, 그 브랜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별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며 셋째, 본사 방침상 명품 브랜드의 주요 소통 채널을 패션 잡지로 책정하여 그쪽에 오랜 기간 광고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매출이 얼마나 올랐나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개나 팔린 겁니까?”, “이 제품의 정가는 얼마고 얼마나 더 오르나요?”등 ‘수치’를 자꾸 묻는 일간지 기자들은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될 수 있으면 영어 표현을 쓰지 않고 한국어로 바꿔 써야 하는 신문 지면의 성격상 그 브랜드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엘레강스한 아이코닉 아이템’, ‘오리지널 프렌치시크’, ‘디테일을 살린 고감도의 로맨티시즘’ 같은 단어는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러니 광고도 하지 않는 신문 매체의 기자에게 본사에서 밝히길 좋아하지 않는 판매량, 매출 등의 수치를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셈이다. 일간지 기자와 명품 업체의 직원들이 탁 터놓고 좋은 취재원과 기자 관계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그들은 알려줄 수 없고 그들이 알리고 싶은 것을 나는 알고 싶지 않거나 기사로 쓸 수 없으니까 말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취재할 때도 통하는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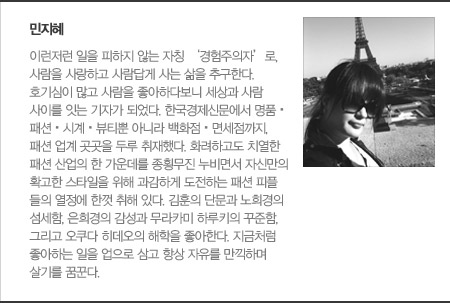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