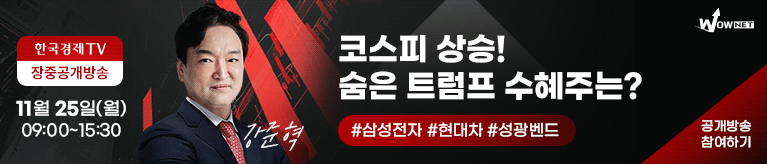<앵커>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기업과 채권단이 맺는 자율협약 과정에서 은행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도권 다툼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은행별 이기주의가 기업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의 빛과 그늘,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분초를 다투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은행간 갈등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기업회생이 진행중인 성동조선. 3년간 3조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면서 작년에는 적자폭이 급감하면서 회생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은행간 갈등은 소송으로 확대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은 작년 11월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은행이 회생기미가 없다며 채권단을 탈퇴하면서 발생한 추가분담액 정산금 40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려야 한다"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혼자만 빠져나가겠다는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원과정에서 체결한 선물환계약 때문에 손실이 눈덩어리처럼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맞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요청한 자율협약을 둘러싸고 채권단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STX그룹 구조조정 과정이나 워크아웃을 졸업한 팬택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싼 은행간 갈등은 성동조선과 마찬가지로 나만 손해를 볼 수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율협약과 관련된 구조조정은 보통 전체 채권기관의 3/4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부 채권은행은 100% 동의를 요구해 무리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은행들의 실적이 급전직하하면서 지연되는 회수기간을 피하거나 충당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이 주도해 빠른 시일내 기업을 정상화 시키자는 자율협약의 취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조정에는 `옥석가리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정된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살리기로 합의했다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의 꼬리자르기를 버려야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