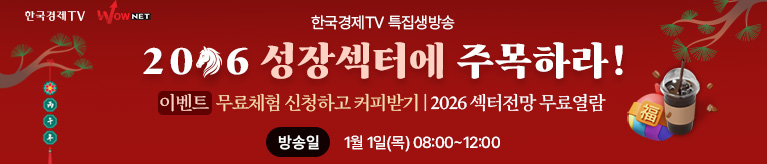독일 의회가 29일(현지시간)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능 확대안을 승인해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발판을 만들었지만, 유럽이 당장 부채위기를 막더라도 경제성장은 수년간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런 구제금융이 유럽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NYT는 미국도 유럽처럼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양의 부채를 쌓았지만, 미국의 부채 대부분이 기업과 소비자들이 조달한 것이라면 유럽의 부채는 정부가 조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 경제는 소비자들이 빚을 갚고 소비를 재개할 때까지 발목이 잡혀 있겠지만, 유럽은 각국 정부가 긴축 등을 통해 분수에 맞게 살 때까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강력한 긴축 조치는 경기를 더욱 악화시켜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최소 10년 동안 경기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기침체는 정부의 부채상환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상황이 미국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나 아일랜드, 그리스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85% 정도로, 미국의 93%보다 낮다는 점이 그 근거다.
또 유럽의 소비자들은 흥청망청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긴축 역시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며, 부채위기를 해결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높은 실업률과 부진한 경제성장으로 `유럽의 병자`로 불렸으나 2000년 초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임금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넣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다른 유럽국가들이 독일과 비슷한 변신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