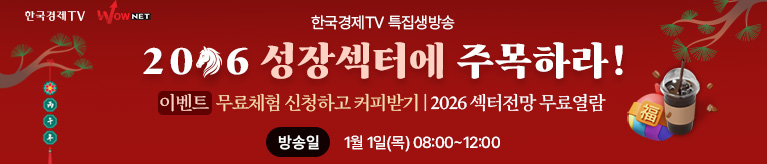<앵커> 최근 태양광 붐을 타고 핵심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과 공급과잉 우려로 후발 기업들은 신사업 자체를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2위 폴리실리콘 업체 OCI의 연간 생산량은 2만7천톤. 앞으로 군산 공장 신증설이 이뤄지면 2012년말에는 생산규모가 지금의 두배인 6만2천톤으로 급격히 확대됩니다.
KCC 역시 자체 생산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합작을 통해 연간 9천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 중으로 내년말까지 1만8천톤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3천2백톤의 케파를 갖고 있는 한국실리콘도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업체 구조조정으로 업체 난립이 정리된데다 고유가를 타고 태양광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에 기존 업체 뿐 아니라 후발 대기업들도 속속 폴리실리콘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은 미국의 웨이퍼 생산업체 MEMC와 합작을 통해 울산에 폴리실리콘 공장을 짓고 2013년부터 연간 1만톤 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화케미칼도 1조원을 투자해 여수에 연산 1만톤 규모 공장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잇따른 진출에 폴리실리콘 사업을 주저하는 곳도 있습니다. LG화학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SK케미칼도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 울산에 데모 플랜트를 짓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2008년 한창 때 kg당 400달러에 육박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잇따른 공장 증설로 부침을 거듭하다 지금은 60~70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조원가의 1/3을 차지하는 전기요금도 변수입니다. 실제로 홍기준 한화케미칼 사장은 kw당 6센트인 한국은 3~4센트 수준인 중국,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공장을 짓더라도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기존업체들이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업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입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