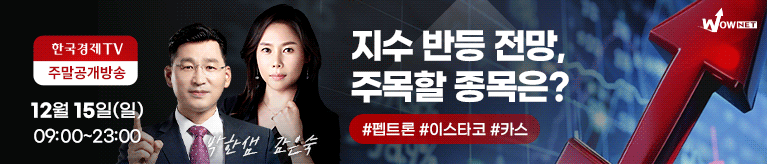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짐 로저스는 "너무 많은 돈을 찍어 잉크와 나무가 고갈될 지경"이라면서 양적완화를 강력하게 비난하는가 하면,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 교수는 더블 딥을 경고하면서 양적완화를 옹호하고 있다.
경제학자와 실물 금융전문가의 의견 대립이야 충분히 있을 수 있다지만, 경제인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연준 의원들마저도 양적완화를 놓고 5시간 반 동안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이건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100여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거의 같다.
이는 경기 사이클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시각만큼은 이견이 없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각차가 발생한 것일까?
양적완화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
노동자들에게 희생이 강요되는 만큼, 경기가 큰 폭으로 침체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지난 FOMC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양적완화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는 것은, 양적완화가 연준 내부에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례가 거의 없는 이 사건을 놓고 또한 시장의 해석도 가지가지다.
한 매체에서는 경제가 침체에 빠져도 양적완화조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생겼다며 버냉키 리더십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다보니 지난 수년간의 버냉키가 벌인 정책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작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은 돈을 뿌리는 것 밖에 없었다면서 말이다.
버냉키가 그런 평가를 받을만큼 정말 능력이 부족한 걸까?
월스트리트저널이 3년마다 조사하는 국제 외환거래를 보면, 2010년도 미 달러화가 세계 외환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5.6%에서 84.9%로, 0.7% 줄었다.
2007년 이래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외환거래 시장에서 달러화를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누구의 공적일까?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소통물량을 크게 늘리지 않았더라면 저 정도의 유통 비율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버냉키는 돈을 그렇게 찍어내면서도 부동산 경기를 교묘하게 틀어막고, 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화폐의 유통 속도를 철저히 제어했다.
화폐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 위험 없이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었고 이제 조달통화로서 전 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의 굳건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만하면 버냉키를 영웅이라 불려도 되지 않겠는가?
<글. 박문환 동양증금증권 강남프라임지점 팀장>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