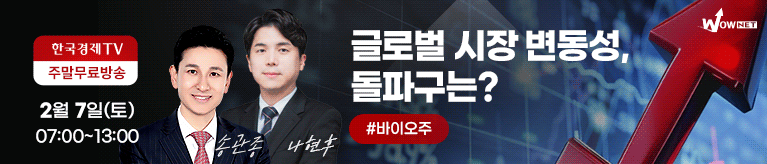1842년 발표된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소설 <외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매서운 칼바람을 견뎌야 하는 9급 말단 관료가 새 외투를 장만하면서 벌어진 일을 다룹니다.
주인공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의 새 외투는 요즘으로 치면 ‘영끌’ 부동산이나 외제차입니다. 새 신분증 같기도 합니다. 그는 한 해 400루블을 받는 9급 관료인데 외투를 새로 맞추느라 연봉 절반을 털어넣었습니다. 이전에 입던 외투가 해져서 재봉사가 더는 기울 수가 없다고 선언했거든요. 동료들은 존재감 없는 정서(正書) 일을 하던 그를 괴롭혀왔는데 새 외투를 보고 태도가 달라져요. 그를 위해 회식까지 잡아요. 그런데 회식을 마친 밤, 불콰하게 술에 취한 아까끼예비치는 귀가하다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깁니다. 이후 열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아까끼예비치를 살해한 범인은 러시아의 강추위가 아니라 그를 향한 냉대입니다. 폐쇄회로(CC)TV도 없던 시대, 그는 외투를 찾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고위 관료를 찾아가요. 고위 관료는 불쾌해합니다. 하급 관료가 중간 관리자들을 건너뛰고 자기를 곧장 찾아왔다고 날뜁니다. 아까끼예비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보라를 삼키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까끼예비치 죽음 이후 그를 닮은 유령을 밤거리에서 마주쳤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유령은 고위 관료의 외투를 빼앗는 복수를 한 뒤에야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유령에게 외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고위 관료의 위세를 벗겨내고 싶었던 거겠죠.
외투는 사회에서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필요한 외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두 각자의 외투를 입고 있죠. 소설은 나는 어떤 외투를 입고 있는지, 외투를 잃어버린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고골은 러시아 제국 하급 관료로 일하며 관료 사회의 부조리를 몸소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문학적 자양분으로 삼아 소설을 썼죠. 필명으로 냈던 초기작이 멸시받자 고향 우크라이나를 소재로 삼아 ‘틈새시장’을 노렸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대 러시아 문학의 시발점이자 리얼리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 도스토옙스키는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