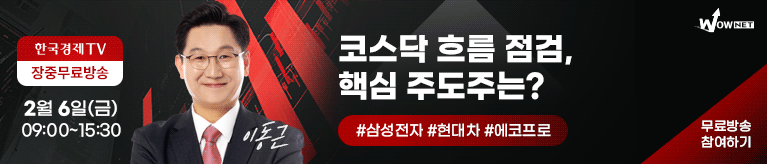작년 12월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2025년 여름 이후 다섯 달 연속 70만 명대를 기록했다. ‘쉬었음’은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2020년 8월 처음 7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이 규모가 장기간 고착된 것은 처음이다.
작년 12월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2025년 여름 이후 다섯 달 연속 70만 명대를 기록했다. ‘쉬었음’은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2020년 8월 처음 7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이 규모가 장기간 고착된 것은 처음이다.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학 졸업자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2020년 대비 약 1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30% 이상 늘었다. 일자리의 ‘수’는 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는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빠르게 쌓였다.
이 현상은 청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체 ‘쉬었음’ 인구는 이미 250만 명을 넘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연령을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이 동시에 막힌 구조적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OECD 평균이 2023~2060년 사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은 30%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46% 감소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구인난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국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산업 전환이 지체됐고 경력 재진입은 실패했으며, 일자리의 질적 미스매치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다. 노동시장의 배치 기능이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대응이 명분이다. 그러나 쉬는 인력이 250만 명을 넘고 전 연령대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막힌 현실에서 기존 일자리를 더 오래 유지하자는 해법이 동시에 제시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정년 연장이 현실화하면 이른바 ‘영식스티(Young Sixty)’ 계층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일과 소득을 유지하는 신(新)고령층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먼저 시행한 일본에선 중장년 근로자를 ‘마도기와조쿠(窓際族·창가족)’라 부르는 자조적 표현이 있다. 핵심 업무에서 배제된 채 창가 주변을 맴돌다가 퇴근하는 현실을 빗댄 말이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과 대기업 정규직에게 정년 연장은 축복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에선 인건비 부담이 생산성 압박으로 전가되며 실제 퇴직 시점이 오히려 앞당겨질 위험이 크다.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2014년 660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불과 10여 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노동 경험도 풍부하다. 대규모 영식스티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을 단순한 복지의 연장이 아니라 지역 기능 유지 전략으로 설계했다. 임금은 높지 않지만 행정·돌봄·생활서비스 등 지역 단위 수요와 연결해 명확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한다. 독일은 중년·고령 노동자를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규정하고, 점진적 은퇴를 기본으로 멘토링과 재배치를 결합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거대한 실업 쓰나미 가능성까지 겹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을 출범시켰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기술 혁신이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인식이다.
한국은 고착화된 청년 실업, 급격한 생산 인구 감소, 고령화와 정년 연장, 그리고 AI 전환이란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이제 삼각파도를 넘어 사각파도의 복합위기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