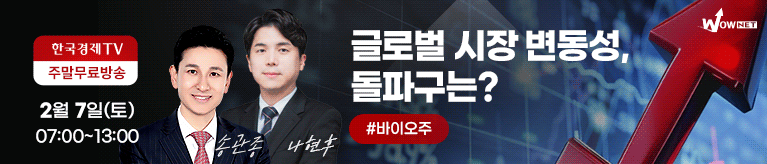"의정보고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뷰를 요청하자 돌아온 한 시민의 반응이다. 실제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 16명 중 11명은 의정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회는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의정보고서 제작·발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막대한 세금만 관행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연간 60억씩 쓰이는 종이 의정보고서

6일 국회 정보 플랫폼인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1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약 755만원이 배정된다. 300개 의원실 전체로 보면 연간 발간비 36억원, 발송료 22억6600만원 등 총 58억6600만원 규모다. 최근 10년 동안 이 항목에 투입된 예산 총액은 549억2460만원에 달한다. 의원실에서 보고서를 제작·배부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국회 예산으로 보전받는 구조다.
의정보고서 외면의 근본 원인은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유권자들의 실시간 스마트폰 검색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실물 책자'의 형태로 재출력해서 배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소모적 행정이라는 평가다. 한 의원실 관계자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비 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 활동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종이 보고서 제작에 매몰되는 소모적인 행정 절차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내용 구성 또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보다 의원의 이미지 홍보에 치우치면서 마치 의원들의 화보처럼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 B씨는 "철저히 공급자 관점에서 치적 과시에 집중하다 보니 유권자의 효능감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세금을 투입해 자기만족을 위한 일방적 홍보물을 양산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배송 및 사후 처리 과정의 비효율도 만만치 않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각 시군구는 연 1회에 한해,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 중인 세대주 정보 중 일부를 임의 추출해 의정활동 홍보 용도로 각 의원실에 제공한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내는 보고서지만, 받은 이들 중 개인정보 확보 경위를 물으며 항의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수취 거부로 반송되는 의정보고서가 의원실에 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반송된 보고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량 파쇄해야 해 사후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의원실 관계자 C씨는 "10만 부를 발행해도 실제 읽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반송본을 일일이 파쇄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이 재차 낭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해야 "
 전문가들은 제도적 취지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연령대를 막론하고 스마트폰 사용률이 100%에 가까워지고 있는만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의정 활동 정보를 알리는 게 시대 변화에도 부합하고 유권자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의 연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령대 스마트폰 사용률은 9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도 96%에 달해 역시 최고치였다. 사실상 스마트폰 사용을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취지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연령대를 막론하고 스마트폰 사용률이 100%에 가까워지고 있는만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의정 활동 정보를 알리는 게 시대 변화에도 부합하고 유권자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의 연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령대 스마트폰 사용률은 9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도 96%에 달해 역시 최고치였다. 사실상 스마트폰 사용을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인 셈이다.실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나도 이걸 만들고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누가 이걸 누가 보겠냐"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가 24시간 공유되는시대에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보다 본인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던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알 권리라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특히 "내용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이 낮다"며 "현직자에게 일방적인 홍보의 장을 제공하는 기득권을 위한 소모적인 제도"라고 진단했다.
매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의정 보고서 형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설명 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 사례처럼 인터넷과 모바일을 병행해 보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면 발간을 줄이는 대신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전자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우/신현보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