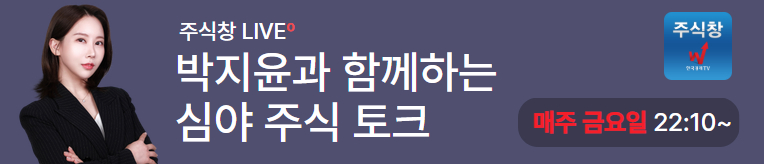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정명훈’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다. 세계 유수의 극장와 악단을 거쳐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에 이르기까지 그의 경력은 언제나 한국 지휘사의 정점으로 기록돼 왔다. 이 위대한 지휘자의 시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다. 그의 막내아들 정민(42·사진)이다.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정명훈’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다. 세계 유수의 극장와 악단을 거쳐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에 이르기까지 그의 경력은 언제나 한국 지휘사의 정점으로 기록돼 왔다. 이 위대한 지휘자의 시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다. 그의 막내아들 정민(42·사진)이다.2022년부터 강릉시립교향악단의 포디엄에 서서 온 그는 이제, 아버지의 거대한 이름 앞에 묵묵히 자신만의 템포로 도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 23일 강릉시립교향악단의 콘서트 오페라 <나비부인> 리허설을 마친 그를 만났다. 올해 첫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으로, 교향곡 대신 오페라를 올린 이유를 ‘경험의 축적’이라고 정의했다. 지난해 콘서트 버전으로 선보인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가 매진을 기록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나비부인’은 두 회차 모두 매진됐지만, 만일 4회를 공연했어도 매진됐을 거예요. 이 작품은 특히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정서가 강릉이라는 도시와 잘 맞아떨어지죠. 무엇보다 훌륭한 악단은 오페라와 심포니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오케스트라를 단련해온 전통적인 이 방식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어요.”
강릉에서 보낸 5년의 시간에 대해 정민 음악감독은 신뢰를 쌓아온 과정이라고 풀이했다. “오케스트라 피트 안에서는 숨을 공간이 있지만, 무대 위에선 표정부터 동작 하나까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콘서트 오페라는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리허설 때 그는 “저를 믿고 소리를 더 내주세요, 돌체!(우아하게), 퍼펙트(완벽해요)”라는 등의 말과 과감한 제스처를 선보였다. 젊은 지휘자의 뒷모습엔 자신감과 노련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강릉이라는 도시와 이 오케스트라는 마치 저를 위한 맞춤 정장 같아요. 다음 목표는 강릉을 ‘한국의 바이로이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그너의 대작 <니벨룽의 반지> 전곡 오페라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연출, 성악가, 기술 스태프까지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된 최초의 링 사이클을 기획 중인 그는 단순한 레퍼토리 도전이 아니라 공연 제작 역량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그는 이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The First Korean Ring(최초의 한국산 반지)이 될 거에요.”
강릉=조동균 기자 chodog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