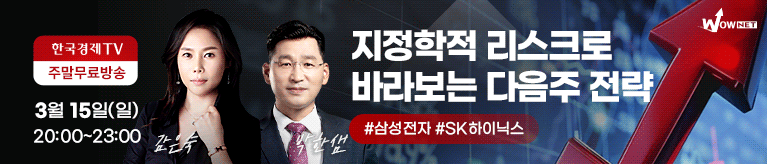1987년 10월 19일 미국 증시가 하루에 22.6% 폭락했습니다. 블랙먼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 밸리 포지에 있는 자산운용사 뱅가드 사옥에는 갑자기 스위스 국기가 내걸렸습니다. 뱅가드 창업자 존 보글의 지시였습니다. 그는 시장의 혼란에 휩쓸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중립국 스위스 깃발을 게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시장의 광기에 흔들리지 말고,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모든 자산운용사에는 펀드 환매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운용사들은 전화 응대를 포기했습니다. 뱅가드는 달랐습니다. 보글은 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나서 고객의 전화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신도 한자리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글은 평소에도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갈 길을 가라(Stay the course)”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저서 제목이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서 뱅가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신뢰는 뱅가드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뱅가드의 고객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앞서 뱅가드는 1976년 최초로 일반 투자자용 인덱스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상장지수펀드(ETF)는 인덱스펀드를 상장한 것입니다. 보글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건초더미를 통째로 사라”고 했습니다. 종목을 고르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시장을 통째로 사는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면에는 펀드매니저들이 떼어가는 수수료에 대한 그의 적대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에는 상당한 수수료가 붙습니다. 하지만 지수만 따라가면 되는 인덱스펀드는 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를 상징하기 위해 보글은 과거 뱅가드의 홈페이지에 가득 차 있는 물잔(투자자들이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을 상징)과 절반쯤 차 있는 물잔(수수료로 인해 수익이 적어지는 것을 상징)을 게시했습니다.
보글은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1000만원을 연평균 수익률 7%짜리 상품에 50년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수수료가 없을 때 50년 후 1000만원은 약 3억원(2억9457만원)이 됩니다. 반면 매년 2.5%를 운용보수와 매매 비용으로 내면 연수익률은 4.5%가 되고 50년 후 투자자의 손에는 9000만원이 주어집니다. 2.5%의 비용 때문에 투자자는 잠재수익의 70%를 날리는 셈이지요. 보글은 “투자자는 위험의 100%를 감수하는데 금융회사가 수익의 70%를 가져가는 것은 수학적 약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히 투자자 입장에 섰던 보글이 인덱스펀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인덱스펀드를 상장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이 최근 투자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ETF입니다. 미국에서는 ETF 수가 상장된 종목 수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국내 ETF 시장도 최근 3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몇 년 전 국내에서 펀드를 대중화시킨 주역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게 매니저가 운용하는 주식형 펀드의 몰락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ETF 하면 되지 뭐 하러 펀드에 가입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TF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리스크가 적은 ETF 시장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ETF가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짐에 따라 자칫 취지와 달리 주식처럼 잦은 매매를 하게 될 가능성입니다.
보글은 이런 이유로 ETF에 반대했습니다. 인덱스펀드를 상장하면 단기 변동성에 휘둘려 빈번하게 매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잦은 매매는 수수료와 세금을 발생시켜 ‘물잔’을 비우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뱅가드는 보글이 물러난 후 수수료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ETF를 내놨고 지금은 세계 2위의 ETF 운용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보글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덱스(지수) 투자는 매매가 아니라 보유하며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것이다.”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한 이때 모든 투자자들이 한번쯤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는 말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