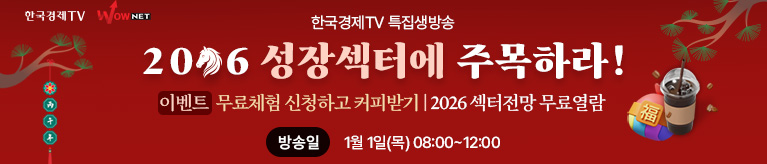2025년 끝자락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 AI는 조용하지만 빠른 속도로 일터에 스며들었고, 특히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기술 진보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그 속도가 문제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고용 구조의 균열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2025년 끝자락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 AI는 조용하지만 빠른 속도로 일터에 스며들었고, 특히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기술 진보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그 속도가 문제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고용 구조의 균열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기관의 전망은 이 변화를 숫자로 보여준다. 시장조사업체 포레스터는 2030년까지 미국 일자리의 약 4.9%, 약 240만 개가 생성형 AI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노동자의 약 7%가 AI로 인해 기존 직무에서 밀려나 다른 직종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약 1200만 명이 직업 전환을 겪을 것으로 본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 내 미국 전체 직장인의 약 5~7%가 AI 영향으로 직접적인 해고나 실질적인 일자리 대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보다 더 넓게 보면 충격의 범위는 훨씬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AI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 비율이 60%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중 절반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자동화 압력 속에서 고용 안정성을 위협받게 된다. 맥킨지가 전망한 근무시간의 30% 자동화는 기업에 인력 감축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은 개인 삶의 리듬이자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다. 무직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을 키우게 된다.
이런 개인적 좌절이 누적되면, 결국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개별 기업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필요하다면 해고를 선택하는 체제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는 비효율이 존재하더라도 대규모 해고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AI 시대에는 이 차이가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인식 격차를 키우며 정치·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피지컬 AI, 즉 신체를 가진 AI 로봇의 등장은 또 다른 변곡점이다. MIT와 보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2025~2026년 사이 미국 제조업에서만 약 200만 개 일자리가 AI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38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자동차 제조와 위험 작업의 5~15%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본다. 물류와 창고 산업에서도 로봇 도입으로 노동력의 10~20%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피규어AI의 로봇인 ‘피규어 02’는 BMW 미국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시트메탈 피킹·적재 등 작업에 투입돼 1250시간 이상 런타임, 3만 대 이상 차량 생산에 기여했다. 이는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움직임을 갖춘 AI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 활용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분명해진 사실은 AI 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기술 속도가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의 속도와 인간의 적응 속도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기업은 효율만을 기준으로 AI를 도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설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의 속도와는 다른, 인간 중심의 적응 속도를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 기술 혁신은 체제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AI 시대의 지속가능성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 기업의 경영 판단 속에서 쌓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