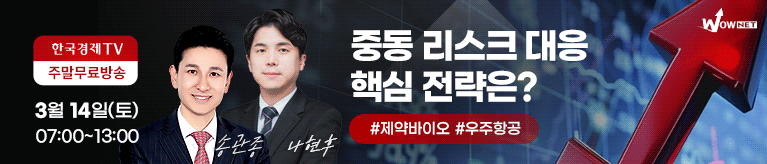지난 3일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8)는 운전석 도어에 선명한 찍힌 자국을 발견하고 멈춰 섰다. 전날까지만 해도 없던 ‘문콕’(좁은 주차 공간에서 차량 문이 서로 부딪혀 생기는 도장 파손·흠집 피해) 자국이 깊게 생긴 것이었다. 화가 난 A씨는 곧장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CCTV를 확인해 가해 차량을 찾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을 동행해야만 보여드릴 수 있다”였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A씨는 인근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CCTV 관리 책임이 아파트에 있으니 다른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만 종이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면 경찰 동행 없이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영상을 두고 관리사무소는 “경찰 없이는 안 된다”고 하고 경찰은 “관리주체가 알아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니 정작 피해자는 그 사이에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결국 A씨는 그날도 차량 흠집만 바라본 채 발길을 돌렸다.
이처럼 문콕 피해자는 가해 차량을 찾기도 전에 CCTV 열람 과정에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파트는 “규정상 안 된다”고 하고 경찰은 “관리주체 책임”이라고 한다. 어느 단지에서는 바로 보여주고 또 다른 곳에서는 “경찰관을 데려오라”고 한다. 같은 법과 같은 사건인데 “운 좋은 사람만 확인하는” 기묘한 구조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는 아예 문콕이 덜 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청 주차장 주차면을 넓히는 방식으로 해법을 꺼내 들었다.
“경찰 없이 못 보여준다” vs “관리자가 보여줄 수 있다”
문콕 분쟁에서 첫 번째 관문은 CCTV다. 피해 차주는 “누가 그랬는지만 알려 달라”고 하지만 관리사무소와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층에 주차한 다른 차량 번호판과 사람 얼굴이 함께 찍혔기 때문에 자칫 통째로 보여주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 동행 없이는 열람이 불가하다”는 자체 규정이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경찰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CCTV의 소유와 관리 책임이 아파트나 기관에 있는 만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면 관리주체가 직접 열람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른 차량 번호판이나 보행자의 얼굴을 종이로 가리거나 손바닥으로 가려도 되고 간단한 모자이크 처리만 해도 된다는 설명이 나온다. 법 조항 해석은 비슷하지만 현장 운영 기준과 책임 부담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
문제는 이 엇갈림의 비용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CCTV 관리책임자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지구대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한 뒤 다시 CCTV 열람 요청을 해야한다. 그 사이에 가해 차량이 빠져나갔는지 저장된 이미 영상이 소실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설령 CCTV로 가해 차량을 특정한다 해도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린다. 사건 접수가 돼서 가해자로부터 보상까지 받으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해야 한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고의’다. 일부러 문을 세게 열어 상대 차량을 찍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문콕의 상당수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경미한 접촉이다. 가해 운전자가 차량에 내려서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히거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발뺌하며 버티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민사소송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길도 있다. 이 경우에도 가해자 특정과 영상 확보가 필요하고 수리비보다 소송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자비로 수리하거나 자기 차량보험으로 처리하고 할증까지 감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문콕은 당해도 보상받기 힘들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예방도 결국 개인 몫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차량 측면을 촬영하는 사이드 블랙박스 수요가 늘어난 이유다. 주차 상태에서 옆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면까지 촬영해 문콕 장면을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용 CCTV가 있어도 열람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개인이 돈을 내고 ‘나만의 CCTV’를 다시 다는 셈이다.
강남구, ‘문콕방지법’ 자발 적용…“애초에 덜 나게 만들자”
강남구청은 이번 논란의 초점을 ‘사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 환경’으로 옮겼다. 강남구는 최근 구청 주차장 주차면을 기존 2.3m에서 2.5m로 넓히는 재도색 공사를 진행했다. 차량 대형화 추세와 문콕 사고 증가 흐름을 반영해 “차라리 칸을 줄이더라도 넓혀보자”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주차면 수는 119면에서 110면으로 9면 줄었다. 그러나 하루 평균 1300대 안팎이 드나드는 구청 주차장에서의 체감은 정반대라는 반응이 나온다. 출입이 잦은 민원인 차량이 많다 보니 “주차와 하차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옆 차와의 간격이 넓어지자 문 열 때 몸을 잔뜩 비틀 필요가 없고 문콕에 대한 불안도 덜해졌다. 그만큼 CCTV 열람 요청과 분쟁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법적 의무도 아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이른바 ‘문콕방지법’은 2019년 3월 이후 신설 주차장부터 적용된다. 2001년부터 사용 중인 강남구 청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구는 민원인의 불편과 문콕 관련 CCTV 열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법 기준’을 스스로 앞당겨 적용했다.
도색 방식도 바꿨다. 기존에는 ‘T자형’ 부분 도색만 돼 있어 주차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고 차량이 삐뚤게 서는 일이 잦았다. 강남구는 전체 라인 도색으로 바꾸어 구획 인식을 높였다. 운전자가 선만 잘 맞춰도 좌우 여유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되도록 한 것이다. 작은 선 하나지만 주차 매너와 공간 활용이 동시에 개선되는 변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사를 찾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이 행정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