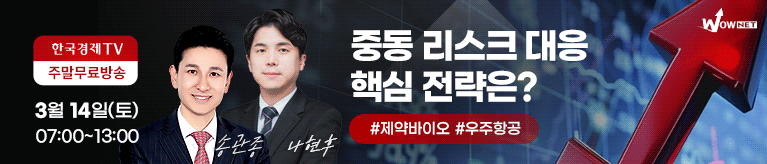PEF업계는 이 같은 인식은 오해라고 항변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을 인수한 PEF는 주주로서 회사의 지배권을 갖는다. 지배권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취할 권리가 포함돼 있고, PEF가 치르는 인수대금에는 현금 창출력의 가치도 반영돼 있다. 매각하는 자산도 공장 설비 같은 핵심 자산이 아니라 유휴부지·건물 등 비핵심 자산이 대부분이다. PEF가 추구하는 것은 자본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이다. 한 PEF 대표는 “핵심 자산을 처분해 기업을 거덜 낸다는 게 PEF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라며 “인수 5~10년 뒤를 내다보고 기업 가치를 올려 팔아야 하는데 기업을 망가뜨리면 손해 보는 것은 PEF”라고 말했다.
물론 과도한 LBO는 기업의 부실을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미국 장난감 유통기업 토이저러스 사례처럼 기업의 현금 창출력으로 PEF의 차입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파산까지 가기도 한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도 MBK파트너스의 대규모 차입 인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사례다.
인수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 레버리지 수준을 결정하는 게 PEF의 경쟁력이다. 차입 없이 인수하면 리스크가 작지만 수익률이 낮아 투자자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한 PEF 전문 변호사는 “글로벌 연기금은 통상 LBO 없이 인수하는 PEF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적정 차입을 일으켜 리스크 대비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PEF로 자금이 몰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