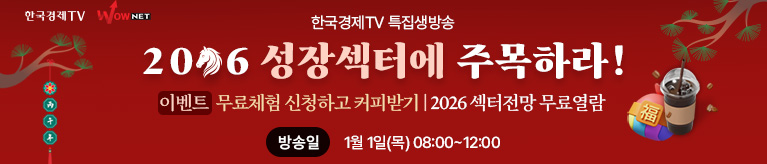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예상보다 올해 한·중 수교 기념일은 조용하네요.”(베이징 주재 한국 기업 임원)
“예상보다 올해 한·중 수교 기념일은 조용하네요.”(베이징 주재 한국 기업 임원)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4일로 33주년이 됐다. 서울과 베이징 어디서도 축하 분위기를 느끼긴 쉽지 않다. 서울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고, 베이징은 다음달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와 미국과의 무역·기술 패권 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중국 측에 전달하기로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은 불발됐다. 중국 특사를 보내지 않은 윤석열 정부 때를 제외하면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중국 특사는 시 주석을 면담한 것과 대비된다.
한·중은 수교 이후 한 세대 이상 경제·안보 격변기를 함께 겪었지만 올해 상황은 특히 험난하다. 급변하는 미·중 관계와 국제질서가 한·중 관계를 미묘하게 몰고 가고 있다. 올해 한·중 수교가 5년이나 10년 단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외교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눈에 띌 만한 행사 자체가 없는 건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지난 1월부터 공석인 주중 한국대사 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다. 그렇다 보니 외교적·경제적으로 중국과 의미 있는 소통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지난 33년간 한·중 관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 수교 당시에 비해 한·중 경제의 역학 구도가 크게 바뀌었다. 중국의 제조 경쟁력과 기술력이 빠르게 치고 올라와 일부 주력 산업에선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 중국이 자립도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 점유율도 추락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약진은 한국 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베이징 왕징 중심가에 있는 대형 쇼핑몰 카이더몰의 매장 배치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과거 쇼핑몰 1층 요지에 있던 삼성전자 매장은 화웨이·애플 매장 등에 밀려 이젠 복도 팝업 스토어로 밀려났다. 원래 삼성전자 매장 자리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가 자리를 잡았다. “중국 파티는 일찍이 끝났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많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에서 중국을 떼어놓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 특히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등에선 중국의 공급망과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있다. 그나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다행이다. 관광 장벽 완화부터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인정하고 실용적 관점에서 국익을 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