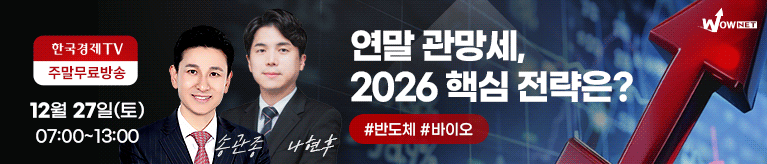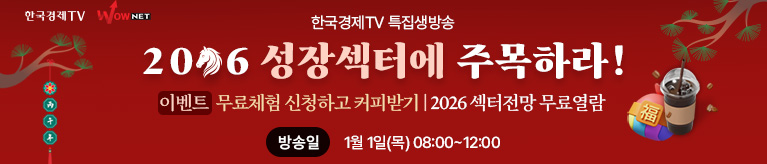일각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던 앞서 두 정부를 경험한 여파로, 새 정부도 뭔가 획기적인 대책(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치는 오히려 불필요한 시장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급적 건설·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는 방침이 더욱 적절합니다.
주택공급은 신규 대책보다 기존에 설정된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공급목표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도 그렇습니다.
만약 거창한 공급정책이 새로 제시되더라도 시장에서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다면 그만큼 시장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대책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자연스레 커지면서 의도치 않게 주택시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과대하게 설정된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후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정부 초기에만 가능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동일 사안을 선거기간이나 정부 임기의 중후반에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동일 맥락으로 기존의 270만호 공급계획을 굳이 승계할 실익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수요억제 등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의 추가 규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우리 사회는 강하든 약하든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사례 등에서 보았듯이 전혀 새로운 규제보다는 종전 사안이 반복될 여지가 크고 시장 과열을 이유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논란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규제를 통해 거래를 억제해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른다면 그만큼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럼 언제까지 억누를 건데?'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도와 동일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특단의 대책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발표가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초기 1년이 좋은 예시입니다. 부동산정책이 두리뭉실한 내용으로만 일관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급격히 수그러들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대선공약에서도 건설·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는 방침이 큰 효과를 가져온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체 국가경제를 다루는 시각에서는 건설·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기도 합니다. 주로 내수산업이고 타 산업들의 등락에 연동되는 부분도 크기에 그렇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