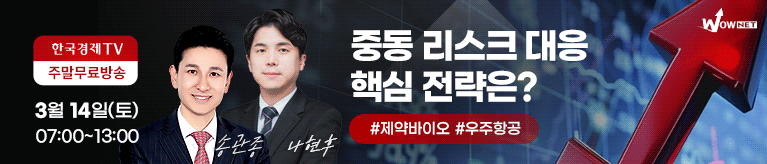◇달러 절상·관세 인상, 양자택일의 문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교역 상대국에 예고한 관세가 모두 현실화하면 미국의 유효관세율이 33.5%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유효관세율이 38%이던 1872년 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수입품에 평균 33.5%의 세금이 추가되면 수입물가는 그만큼 뛴다. 협상을 거쳐 관세를 일부 유예하거나 인하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유효관세율은 15%에 달한다. 1928년 대공황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이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을 견딜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세 인상과 달러 절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교역 상대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오른다. 관세를 부과한 만큼 수입품 가격이 올라 수입 규모가 줄고 상대국 통화를 사려는 수요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시작해서 환율전쟁으로 끝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관세전쟁을 선포해 상대국을 압박한 뒤 환율을 양보받는 전략을 반복했다.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긴급수입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 태환을 중지하며 시작된 ‘닉슨쇼크’는 같은 해 12월 금에 대한 달러 가치를 8% 평가절하(주요국 통화가치 절상)하는 스미스소니언협정으로 끝났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를 주고받은 관세전쟁도 2020년 1월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단계 미·중 무역합의로 마무리됐다.
◇원화 절상 수단 마땅찮은 정부
원화 절상은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바라는 부분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한 적정 환율을 달러당 1300원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 달러당 1400원대에 머물다 최근 13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는 현재의 원·달러 환율이 30~40원가량 하락(원화 절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정부의 고민은 이를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대외 요인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달러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를 근거로 “코로나19 이후 환율 상승 요인의 약 90%는 국내 요인에 따른 원화 약세가 아니라 대외 요인을 반영한 달러 강세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원화 절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국민연금의 외화자산 매입 조정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부총재 출신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분기 단위로 공개하던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현황을 월 단위로 단축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미 국채 매도로 국채 금리가 들썩이는 것을 미국 정부가 신경 쓰는 만큼 우리 연기금과 기관이 미 국채를 더 사들이겠다는 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두 나라가 환율과 통상협상을 별개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환율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상호관세나 품목관세 인하와 같은 통상협상 성과로 연결시킬지도 외환·통상당국의 고민이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은 없다는 게 외환당국의 일관된 설명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외환시장 규모는 1985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주요국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환율에 ‘임팩트’를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영효/김익환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