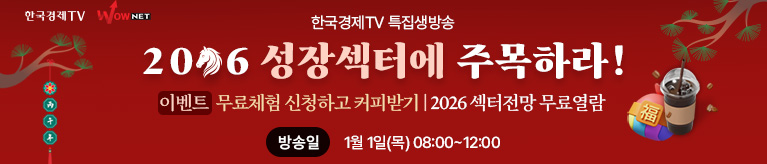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의 회사채 출혈 경쟁이 심해진 기점을 2023년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찾는다. 당시 금융위는 회사채 발행 주관사라고 하더라도 만기가 다른 회사채에는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사 2년 만기 회사채의 대표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A사 3년 만기 회사채에는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회사채 발행 기업들은 “2년물 주관사를 맡으려면 3년물 수요예측에 낮은 금리를 제시하라”고 증권사들에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다수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은 증권사에 회사채 금리를 낮춰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증권사는 주관사 명단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달 들어 회사채를 발행한 한 대기업은 매일 수요예측 참여 희망 증권사들을 소집해 회사가 원하는 금리만큼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채 주관사가 과거 2~3개 수준에서 최근 7~8개까지 늘어난 배경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채권연구센터 센터장은 “회사채 발행 상위 30개 기업이 전체 회사채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구조적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대기업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수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은 증권사에 회사채 금리를 낮춰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증권사는 주관사 명단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달 들어 회사채를 발행한 한 대기업은 매일 수요예측 참여 희망 증권사들을 소집해 회사가 원하는 금리만큼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채 주관사가 과거 2~3개 수준에서 최근 7~8개까지 늘어난 배경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채권연구센터 센터장은 “회사채 발행 상위 30개 기업이 전체 회사채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구조적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대기업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증권사의 큰 수익원이던 부동산금융 시장이 망가진 영향도 컸다. 더 이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대형사는 물론 중소 증권사까지 대거 회사채 시장에 뛰어들었다. 회사채 발행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대기업과 맺은 관계를 통해 향후 계열사의 유상증자와 기업공개(IPO) 주관, 퇴직연금 등을 따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이 전통적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을 필두로 키움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등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메리츠증권까지 뛰어들었다. 회사채 전문 인력을 영입하는 한편 4000억원 규모 회사채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비정상적인 회사채 발행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회사채 발행에 참여하려던 한 대형 증권사가 내부 심사기구의 제동에 자금 40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단적인 예다.
배정철/노경목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