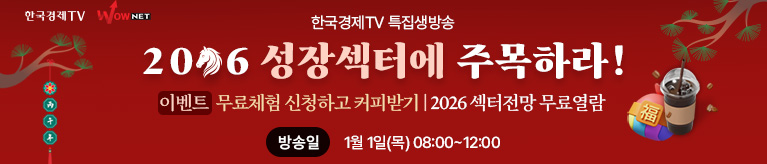26일 서울 대학로에서 만난 뮤지컬 ‘베르테르’의 연출가 조광화 감독은 주인공 베르테르만큼이나 뜨겁게, 사랑에 대한 지론을 펼쳤다. 그는 “늘 베르테르에게 이입하다가 감정선이 너무 힘들어 이제는 알베르트(롯데의 약혼자)이고 싶기도 했는데 일하면서 다시 베르테르가 되더라”고 말했다. 초창기 공연부터 호흡을 맞춘 조 감독과 구소영 협력연출 겸 음악감독에게 베르테르의 변천사와 고전 뮤지컬의 매력을 들어봤다. 베르테르는 다음달 16일을 끝으로 올해 무대를 마친다.
올해 창작 25주년을 맞은 베르테르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장수 뮤지컬이다. 연극계 스타 연출가 겸 극작가인 고선웅 서울시극단장이 독일 대문호 괴테가 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무대 언어로 각색했다. 약혼자가 있는 롯데를 향한 베르테르의 순수하고 애절한 사랑에 매료된 관객들이 공연을 수차례 반복 관람해 ‘회전문 관객’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조 감독은 고전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에 대해 “세상 사는 모습이 아무리 제각각이라 해도 성격의 전형성이라는 게 있다”며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달라져도 어떤 상황을 보자마자 누구나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캐릭터가 고전 속에 있다”고 말했다.
베르테르는 2002년 재정적 문제로 재연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내 최초 뮤지컬 동호회인 ‘베사모’(베르테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모금에 나서 2003년 재연을 성사시켰다. 구 감독은 “크라우드 펀딩 문화가 없었을 때인데 자칫 날릴 수도 있는 돈을 기꺼이 모금해주셔서 정말 축복받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베르테르는 세월을 거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베르테르를 대표하는 꽃이 2013년 붉은 장미에서 노란 해바라기로 바뀐 게 대표적이다. 당시 조 감독은 만족스러운 엔딩 장면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꿈에서 펼쳐진 해바라기 꽃밭에서 해답을 찾았다. 조 감독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반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와 어긋나는 운명을 다룬 소피아 로렌 출연의 영화 해바라기가 베르테르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베르테르의 극단적 선택을 쓰러지는 해바라기에 비유한 엔딩은 관객들이 극찬하는 장면 중 하나다.
베르테르는 손이 많이 가는 작품이다. 관객들이 주인공들에게 공감해야 하는데 배우들의 미묘한 연기 톤 변화에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감독은 지휘는 물론 피아노까지 직접 연주한다. 사실상 숨소리를 큐사인 삼아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셈이다. 그는 “일부 객석에서는 제가 피아노를 치며 연주자들과 호흡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잘 알려지지 않은 관람 팁을 공유했다. 구 감독이 가장 아끼는 넘버(뮤지컬 속 노래)는 ‘발길을 뗄 수 없으면’이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요즘, 서정성이 강한 베르테르가 지니는 의미는 뭘까. 두 감독은 한 관객의 표현을 빌려 베르테르를 “잔잔한 도파민을 뿜어내는 뮤지컬”이라고 소개했다. 태양초 고추가 인공 캡사이신에 비해 매운맛은 덜할지라도 더 깊은 풍미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
해바라기 등 핵심 콘셉트는 그대로 두되 롯데와 베르테르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더욱 섬세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출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조 감독은 “시대 변화에 맞춰 관객들이 작품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감독은 “베르테르는 삶이 무료한 분,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보면 좋은 뮤지컬”이라며 “비록 유치하고 위험할망정 한번 뜨거워져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구 감독도 보탰다. “극 중 펍 주인 오르카가 부르는 넘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도 왕년에는 뜨거운 사랑 했었지’라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무모하게 내 전부를 걸 만큼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는 자신도 보고요.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베르테르를 보며 가장 뜨거웠던 때의 나를 추억할 수 있을 겁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