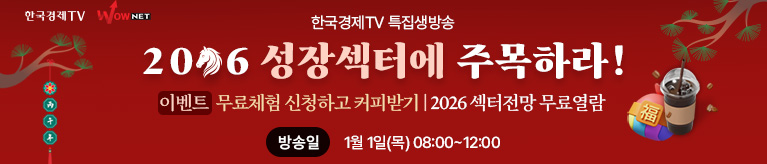미국 바이오기업 인실리코메디신이 양자컴퓨터로 항암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신약 개발에 양자컴퓨터가 사용돼 가시적인 성과를 낸 첫 사례다. 구글 딥마인드가 바이오산업용 인공지능(AI) 모델인 ‘알파폴드’로 노벨 화학상을 거머쥔 지 3개월 만에 기술 패러다임이 또 한 번 바뀌었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물질을 찾아 테스트하고, 효과가 기대 이하면 다음 물질로 넘어가는 지루한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해야 했다. 슈퍼컴퓨터와 AI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반복적인 테스트 작업은 기계의 몫이 됐다. 짐을 나르는 데 손수레 대신 트럭을 쓰게 된 셈으로, 엄청난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양자컴퓨터와 AI의 조합은 화물용 비행기에 비유할 수 있다. 속도에서 차원 자체가 달라졌다. 구글은 최근 양자컴퓨터 윌로를 발표하면서 “슈퍼컴퓨터가 우주의 나이보다 긴 10자(10의 25제곱)년간 해야 할 계산을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컴퓨터도 단점은 있다. 1000번에 한 번꼴로 계산이 틀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오 등 일부 분야는 예외로 봐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찾는 1차 작업만 양자컴퓨터에 맡기고, 정밀성이 요구되는 2차 작업은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면 된다. 업계에서는 고성능 컴퓨터와 AI를 활용한 의료시장이 연평균 48% 성장해 2029년 1484억달러(약 2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휙휙 바뀌는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지만, AI 분야에선 미국 빅테크와의 격차가 상당하다. 양자 분야는 아예 비교가 무의미하다. 미국의 양자컴퓨터 기술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국은 2.3점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기술 수준 지도’를 통해 털어놓은 수치다. 우리 기업들이 신기술 전쟁에서 뛸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