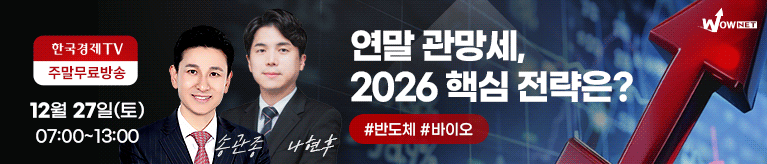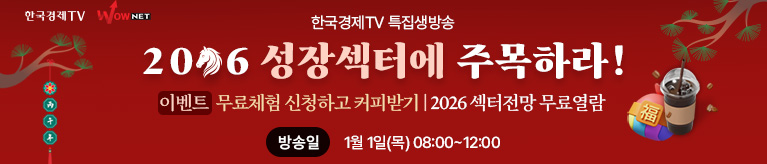은행은 오랫동안 대면(對面)산업의 대명사였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은행업이 시작된 이후 은행원을 만나지 않고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 돼서다.
은행은 오랫동안 대면(對面)산업의 대명사였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은행업이 시작된 이후 은행원을 만나지 않고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 돼서다.은행원은 예나 지금이나 선망의 직업이다. 은행이 면허사업이어서 대체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졸과 고졸 직군을 나눠 뽑을 때 특히 고졸 직군에선 성적 우수 학생이 주로 입행했다. 대졸이라 하더라도 고졸이 맡는 영업점 창구를 거치는 것은 필수였다. 출납, 예·적금, 카드, 가계대출, 종합상담 등의 업무를 익혔다. 고졸 창구 여직원도 실적이 뛰어나면 승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창구 직원이든 본점 간부든 은행에 종사하면 모두 은행원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창구 직원을 텔러(teller)로 칭하며 뱅커(banker)와 구분하는 것과는 다르다.
은행원을 만나지 않고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것은 출금과 입금 순이었다. 1975년 현금자동지급기(CD·cash dispenser)가 도입됐고 1980년대 중반엔 현금자동입출금기(ATM·automated teller machine)가 널리 퍼졌다. 1990년대 중반 콜센터가 구축됐고 1999년부터는 인터넷뱅킹이 시작돼 굳이 창구에 가지 않더라도 상당수 업무를 처리하는 게 가능해졌다. 국내에서 아예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는 금융서비스는 2017년 카카오뱅크가 설립되고 나서다.
이제는 은행원 업무를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흐름이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 기반의 AI 은행원 허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금융사 내부 전산망과 외부망 분리를 강제하는 규제를 완화한 뒤 후속 조치다. 외부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상담과 정보 제공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 요약은 기본이며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준다. 당장은 아니지만 말만 하면 AI가 예금이나 대출을 처리하는 날도 머지않았다.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화는 은행 업무 처리 방식까지 통째 바꾸고 있다.
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