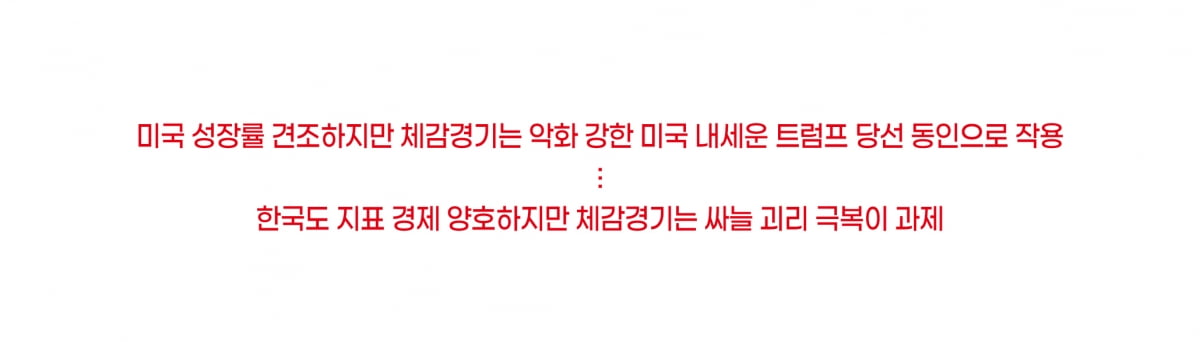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6일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중 눈에 띄는 종목은 8.74% 오른 캐터필러였다. 트럼프의 대선 메이트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기타 금융주를 제외하면 단연 돋보였다.
캐터필러는 세계 최대 건설장비 제조업체다. 건설장비 수요가 늘수록 실적이 좋아진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고 캐터필러도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주가를 견인했다.
캐터필러의 약진은 트럼프 압승의 요인을 그대로 나타낸다. 트럼프는 초지일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와 ‘Trump will fix it’을 외쳤다. 미국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모든 걸 고치겠다는 거였다. 투박하게 얘기하면 ‘관세와 이민의 장벽을 높이 세우고 세계 경찰로서의 부담금을 대폭 줄인 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을 우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미국민을 더욱 잘살게 하겠다’는 호언장담에 유권자들은 열광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가 내세웠던 민주주의의 확대나 기후변화 대응, 낙태권 등은 한가한 이슈로 치부됐다.
미국 밖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의아해진다. 미국 경제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8%에 달하는 등 견조하다. 실업률도 낮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1%로 떨어지는 등 인플레이션도 주춤하다. 지표로만 보면 이보다 좋은 나라도 없다.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트럼프에 열광하다니?
결국은 체감의 문제였다. 지표는 좋지만 체감경기는 형편없기 때문이다. AP통신의 AP보트캐스트가 1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지 후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고물가와 일자리 등 경제이슈(39%)가 꼽혔다.
대표적인 곳이 펜실베이니아주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였다. 노조세가 강한 이들 지역은 한때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이들 지역의 임금은 1980년대만 해도 미국 평균보다 7%가량 높았다. 지금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물가는 비싸다.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주가 속한 중부·대서양 경제권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로 미국 전체(2.1%)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 경합주(swing state)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관공서와 대학이 몰려 있는 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들 지역에서 민주당은 ‘리무진 리버럴(고급 승용차를 타는 좌파)’이 지배하는 엘리트 정당으로 취급됐다고 한다. 우리 식으로 하면 ‘강남좌파 정당’이다.
미국의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를 연상케 한다. 우리 경제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유일한 나라(세계은행)’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지표도 좋다. 3분기 성장률이 0.1%로 주춤했지만 연간으론 2%대 성장이 무난하다. 수출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9~10월 연속 1%대로 안정돼 있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장보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음식업 등 자영업자의 폐업은 줄을 잇는다. 정부는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 괴리를 어떻게 좁힐지가 정부와 여당에 주어진 과제다. 괴리를 좁히지 못한 채 정치이슈에 끌려다니면 결과는 뻔하다. 1992년 빌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내세웠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는 어느 나라 선거에서나 통용된다.

하영춘 한경비즈니스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