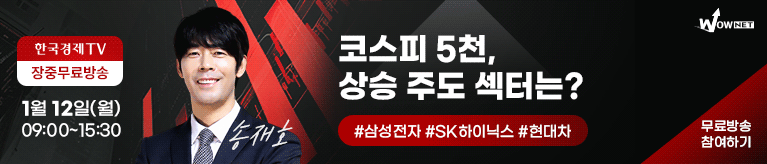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행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재정비촉진지구에도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행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재정비촉진지구에도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서울시는 땅값이 낮은 지역의 재개발 분양 가구 수를 대폭 늘려주기 위해 최근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1㎡당 586만원 이상인 구역은 사업성 보정계수(단지 규모, 밀도 등을 고려해 용적률에 반영하는 계수)를 최대 2까지 적용받아 분양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주택을 사실상 짓지 않아도 되는 재개발 구역도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현황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곳에선 현황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공공기여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채워 임대주택 없이도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 최대치를 채울 수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 지원 방안을 뉴타운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 확보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뉴타운은 일반 재개발보다 요구하는 도시기반시설이 많다. 대규모 빌라촌을 재개발할 때 특정 구역만 새 아파트를 지어 주변 도시기반시설은 노후화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게 뉴타운이다. 처음 도입할 당시 최소 면적 기준이 50만㎡에 달한 이유다.
공공기여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최대로 확보하려다 보니 용적률을 쉽게 채울 수 있는 허용용적률 개념이 뉴타운에는 없다.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리려면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확보로만 가능하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허용용적률 개념을 임의로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은 높아지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 확보에 쓰게끔 규정하고 있다. 일반 재개발에선 각종 기준만 충족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뉴타운에선 각종 기준 충족뿐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지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재개발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고, 조례에도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