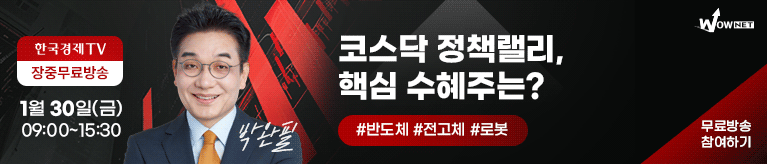배우 최민식이 얘기한 ‘극장값’이 화제다. 그는 지난달 한 방송에서 “지금 극장값도 많이 올랐다. 좀 내려야 한다.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라고 말해 극장값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를 두고 한 경영학과 교수가 “무지한 소리”라고 직격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영화산업과 가격 문제는 우리 관심이 아니니 논외로 하고, 다시 제기된 ‘극장값’ 논란은 오래된 ‘버스값’ 논쟁을 재소환한다.
‘값’은 본래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시내버스값 무료화 추진” “택시값 비싸도 이용자 많다, 프리미엄 택시”처럼 ‘버스값’ ‘택시값’ 같은 말을 흔히 사용한다. 그런데 예전엔 이런 말이 모두 잘못 쓰는 표현이었다. ‘값’은 본래 물건을 사고팔 때 치르는 대가를 뜻하기 때문이다.이에 비해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은 ‘요금’ 또는 ‘비용’이다. 그러니 버스값, 택시값은 버스나 택시를 사고팔 때 치르는 돈을 뜻하고,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은 버스요금 또는 버스비, 택시요금 또는 택시비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었다. 이를 좀 더 근사한 말로는 고유어로 ‘삯’이라고 한다. ‘삯’은 일을 한 데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 또는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주는 돈이다.
1957년에 완간된 <조선말큰사전>(한글학회)에서도 그랬다. ‘값’은 △사람이나 물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가치), △매매하기 위해 작정한 금액, △매매 목적으로 주고받는 돈을 의미했다. 즉 무엇을 사고팔 때의 가격 또는 가치로 풀었다. 지금은 ‘값’의 용법이 10여 가지는 된다. 의미가 더해지면서 말의 쓰임새가 확대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 초판본만 해도 <조선말큰사전>의 풀이가 그대로 이어져왔다. 몇 가지 현대적 의미와 용법이 추가되었지만 딱히 논란이 될 거리는 없었다. 그런데 이후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보인다. 일곱 번째 항에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란 풀이가 추가된 것이다.
지금은 서비스 이용료·비용 뜻도 있어
즉 ‘값’의 전통적 의미와 용법 외에 ‘대금이나 비용’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풀이가 더해진 것이다. 다른 항목들이 본래 의미를 현대적 쓰임새에 맞게 세분화한 것에 비해 이 항목은 전에 없던 새로운 의미와 용법을 추가했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초판본(종이 사전)이 1999년에 나왔고 2008년부터 웹사전을 선보였으니 그 이후 넣었을 것이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기름값, 물값, 물건값, 부식값, 신문값, 우윳값, 음식값 같은 말이 이렇게 해서 ‘값’과 어울리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그중 대표적 단어가 ‘전셋값’이다. 전세금 또는 전셋돈은 전세를 얻을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맡기는 돈을 말한다. 원래 이런 말로 쓰이던 게 1990년대 들어 ‘전셋값’이 급속히 떠오르면서 앞의 말을 대체했다. 특히 1999년도에는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는데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30% 육박” 같은 표현이 연일 지면을 도배질하다시피 할 정도였다.
 그런데 전세는 기한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니 원래 ‘값’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금 또는 전셋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셋값’은 현실 언어에서 이들을 압도하는 ‘대세어’로 자리 잡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 뒤 웹사전을 내면서 표제어 ‘값’의 풀이에 대금이나 비용의 뜻을 나타낸다고 추가한 것은 이런 실태를 수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니 ‘극장값’을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데 드는 돈으로 풀고, ‘버스값’을 버스를 타는 데 드는 값으로 설명해도 하등 문제 될 게 없다.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식 단어로 오르지 못했어도 개방 사전인 <우리말샘>에는 이미 올라 있다. 하지만 정통 규범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극장값’이 여전히 거슬린다.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전세는 기한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니 원래 ‘값’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금 또는 전셋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셋값’은 현실 언어에서 이들을 압도하는 ‘대세어’로 자리 잡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 뒤 웹사전을 내면서 표제어 ‘값’의 풀이에 대금이나 비용의 뜻을 나타낸다고 추가한 것은 이런 실태를 수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니 ‘극장값’을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데 드는 돈으로 풀고, ‘버스값’을 버스를 타는 데 드는 값으로 설명해도 하등 문제 될 게 없다.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식 단어로 오르지 못했어도 개방 사전인 <우리말샘>에는 이미 올라 있다. 하지만 정통 규범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극장값’이 여전히 거슬린다.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