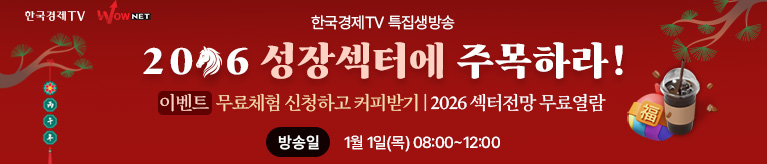“배터리 충전량과 급속 충전 여부 등이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회사 모두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셀 내부 편차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결함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윤원섭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차세대배터리연구소장·사진)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윤 교수는 과충전이 화재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100% 충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론상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양극의 에너지용량 100%는 g당 275㎃h인데 우리가 쓰는 건 200~210㎃h”라며 “배터리업체와 자동차회사는 완전히 충전해도 실제 충전은 90~95%까지만 되도록 안전 마진을 갖고 설계·검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기차 과충전이나 온도 습도 등 외부 요인을 제어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벤츠 전기차 화재도 뜨거운 실외가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다”며 “온도 습도 등 외부 환경도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충돌 없이 난 화재는) 현대차도 최근 3년간 한 건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배터리 셀에 결함이 있거나 이를 컨트롤하는 BMS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회사들이 만드는 셀이 수억 개에 달하는 만큼 어느 정도 셀의 편차가 생기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셀을 계속 사용하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온도와 전압 변화 등 시그널을 반드시 내보낸다”며 “(차량이 전소돼도 클라우드 등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자동차회사는 센서를 통해 이를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 제조사 공개는 안전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최근 완성차업체와 배터리업체가 합작회사를 세워 배터리셀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제품 개발과 품질 보증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배터리, 자동차 전문가와 협의해 근본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충전율과 화재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마녀사냥’과 비슷하다”며 “전기차는 세계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한국의 경쟁력과도 연관된 산업인 만큼 (이번 화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