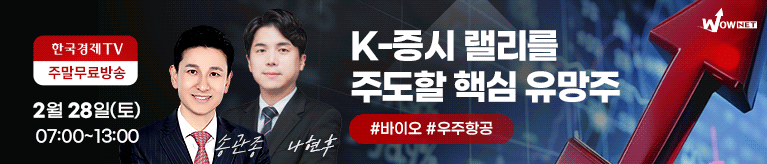윤지수(31·서울특별시청)가 한국 여자 펜싱 사브르 역사를 새로 쓴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윤지수는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전하영(22·서울특별시청), 최세빈(23·전남도청), 전은혜(27·인천광역시 중구청)와 은메달 얻었다. 3년 전 도쿄에서 '막내'였던 윤지수는 이번에는 맏언니로 대표팀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 은메달은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의 동메달을 뛰어넘는 한국의 올림픽 여자 사브르 단체전 최고 성적인데, 윤지수는 두 대회 모두 출전한 유일한 선수다. 빼어난 실력과 함께 최근에는 그룹 에스파 윈터를 닮은 미모로 더욱 주목받았다.
윤지수는 과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고독한 황태자'로 명성을 떨쳤던 윤학길의 딸이다. 윤학길은 KBO리그 역대 최다 완투(100경기), 완투승(75승)을 거둔 전설의 투수로, 앞으로도 윤학길의 기록은 깨지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설로 꼽힌다. 현재는 KBO 재능기부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윤지수를 "황태자의 딸", "롯데의 딸"로 불려왔다. 하지만 한국 펜싱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여자 단체 사브르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검객 윤지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윤지수는 1993년생으로, 윤지수는 중학생 시절,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펜싱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스포츠인의 길을 걸었고, 남다른 운동신경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그리며 2012년부터 태극마크를 달고 여자 사브르 대표팀의 '막내'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
2014년 인천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단체전 우승에 힘을 보태고, 도쿄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 때도 윤지수는 막내였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 이후 김지연(현 SBS 해설위원)이 태극마크를 내려놓는 등 대표팀이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윤지수는 맏언니가 됐고,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시대를 알렸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는 16강서 조기 탈락하는 아쉬움을 남겼으나, 단체전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펜싱의 새 역사를 썼다.
윤지수는 결승전에 나서지 않았다. 전략적 차원에서 프랑스전을 소화한 뒤, 다음 올림픽에 나설 후배들이 결승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한 것.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와 함께 윤지수 개인은 올림픽 2개 대회 연속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윤지수는 경기 직후 "한국 여자 사브르를 최초로 은메달을 목에 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후배들이랑 함께 은메달을 목에 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들이 잘해줘서 너무 멋있었다"며 "선배로서 후배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또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도쿄 동메달에서) 색을 바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다만 윤지수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했다. 그는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에는 이 친구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게 선배로서 도와주고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아빠! 나 벌써 메달 2개 땄어"라고 외치며 웃었다. 윤지수의 아버지인 윤 위원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때 시범종목이던 야구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한 경험이 있으나 당시 대표팀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하며 입상하진 못했다. 윤지수가 아버지가 못 이룬 기록을 갖게 된 셈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