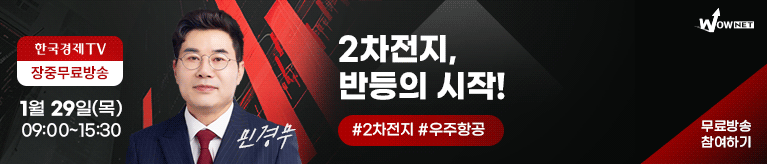서울시가 2003년 주거지를 1종(단독·빌라)과 2종(중층 아파트), 3종(고층 아파트)으로 세분화하면서 재건축 후 용적률을 대폭 낮췄다. 3종 주거지의 용적률 상한선은 300%로 떨어졌다. 또 용적률 최소치를 기준용적률(210%), 각종 인센티브를 충족한 허용용적률(230%), 건축물·토지·현금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받은 상한용적률(250%)로 정했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지어 서울에 공급하면 법적상한용적률(300%)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별다른 규제 없이도 400%를 채울 수 있었던 1990년대와 달리 서울시가 요구하는 규제 항목과 기부채납, 임대주택을 지어야 용적률 300%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90년대 아파트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해진 이유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지원 방안’은 이 같은 과밀아파트도 재건축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대책이다. 과밀아파트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적률이 조례상 허용용적률(230%)을 넘는 단지다. 서울의 149개 단지, 총 8만7000가구가 해당한다. 서울시는 조례상 허용용적률(3종 주거지 230%)을 초과해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현황용적률(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현황용적률이 265%인 아파트는 재건축 때 용적률 상한선인 300%까지 채우려면 25%포인트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소유권을 넘겨야 했다. 분양에 쓸 수 있는 용적률은 275%로 기존에서 고작 10%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부채납으로 떼이는 토지까지 고려하면 ‘1 대 1 재건축’도 어려운 셈이다. 하지만 앞으론 용적률이 265%인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하면 임대주택에 투입하는 용적률이 7.5%포인트로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