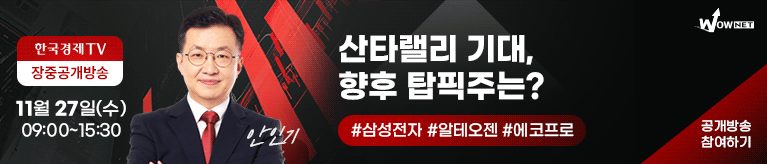“30년 뒤 고령층은 지금의 어르신과는 다른 모습일 겁니다. 진짜 ‘액티브 에이징(활기찬 노년)’이 구현되는 것이죠.”
 국내 인구학 연구의 대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0년 뒤 대한민국 사회를 이같이 예견했다. 기술 발달로 고령층의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기 활용도 능숙해 현재 어르신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수는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는 스마트폰, 컴퓨터 산업을 이끌어 온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80세 이상 초고령층이 될 때는 굉장히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로봇을 쓰더라도 하나의 기능만 쓰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연동되는 뭔가를 더 원할 것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인구학 연구의 대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0년 뒤 대한민국 사회를 이같이 예견했다. 기술 발달로 고령층의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기 활용도 능숙해 현재 어르신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수는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는 스마트폰, 컴퓨터 산업을 이끌어 온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80세 이상 초고령층이 될 때는 굉장히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로봇을 쓰더라도 하나의 기능만 쓰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연동되는 뭔가를 더 원할 것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액티브 에이징의 특성은 소비에서 두드러진다. 10여 년 전부터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실버산업이 유망하다는 전망이 잇따랐지만, 정작 현장에선 수요가 미미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조 교수는 “시장에선 베이비붐 1세대가 90~100세 노인이 됐을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버산업이 뜰 거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요양원, 요양병원 몇 군데밖에 없다”며 “30년까지 가지 않고 10년만 지나도 ‘실버산업의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30년 뒤 한국 사회에 액티브 에이징만 있는 건 아니다.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 변화 추세를 보면 30년 뒤 초고령화는 더 가속화된다. 조 교수는 “30년 뒤 중위 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은 60세”라며 “나이가 60세가 됐는데도 본인보다 더 어르신이 우리 사회에 바글바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이 많아지고 청년층이 줄어들수록 적지 않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브레인 드레인(인재 유출)’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똑똑한 친구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30년 뒤 대한민국은 정말 노인끼리만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지금이라도 결혼과 출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문화화되고, 굉장히 빠르게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2030년대, 2040년대를 조망하고, 지금까지 해온 제도와 정책은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놓은 것이니 급감하는 데 맞춰서 미리 바꿔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년 연장이나 연금 개혁 문제 등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대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저출산 문화’라는 물줄기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조 교수는 또 30년 뒤를 준비하기 위해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성장 공식대로 진행했는데 생각만큼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기업들은 느끼고 있다”며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 역시 마주해야 할 시장이 글로벌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력을 올릴 수 있지만 AI가 소비까지 대신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점점 더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게 하고, 그 돈으로 국가는 사회적 부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