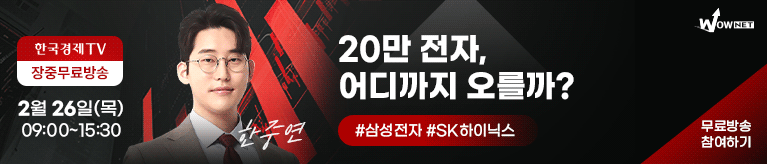지난 26일 VIP 개막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이어진 ‘아트바젤 홍콩 2024’. 세계 40개 국가에서 242개 갤러리가 참가한 올해 행사는 ‘아시아 최대 미술장터’라는 명성과는 달리 ‘끝까지 볼 게 없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관람객 수 또한 평균 이하였다. 닷새간 이어진 미술 장터에는 7만5000명의 손님이 모였다. 기존 아트바젤 홍콩의 평균 관객 수(8만 명)에 못 미치는 규모다. 홍콩 당국은 페어의 실패에 놀란 눈치다. 올해 아트바젤 홍콩을 세 가지 키워드로 분석했다.
◆‘차이나 포비아’로 위축
아트바젤 홍콩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끝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심화된 ‘차이나 포비아’가 꼽힌다. 프랑스 갤러리 마리안굿맨, 미국의 션켈리 등 미주와 유럽권 대형 갤러리들이 중국의 검열 리스크를 우려해 불참했다. 이들이 나오지 않자 자연스레 수백억원대 작품도 페어에서 자취를 감췄다. ‘페어에 볼 것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관객들에게도 ‘차이나 리스크’는 컸다. 아트바젤 홍콩 개막을 사흘 앞둔 지난 23일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며 각국 여행자들에게도 ‘주의하라’는 경고가 내려졌다. 바젤 참여를 위해 홍콩에 입국하려던 서구의 ‘슈퍼 리치’들이 직전에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미국 갤러리스트는 “올해는 당초 출품작을 상의할 때부터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자기 검열’을 했다”며 “중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해외 관객도 적어져 내년 행사에 참가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선명해진 양극화
‘미적지근한 페어’라는 평가에도 이번 홍콩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갤러리들은 존재한다. 하우저앤드워스, 페이스갤러리, 데이비드즈워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갤러리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싸지만 가치가 있는 ‘똘똘한 작품’들만 골라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하우저앤드워스는 900만달러(약 120억4000만원)에 달하는 빌럼 데 쿠닝의 작품을 팔며 첫날 최고가 판매 갤러리에 등극했다. 필립 거스턴의 850만달러(약 114억7900만원)짜리 작품도 넘겼다. 거스턴의 작품은 수요가 넘친 나머지 하우저앤드워스는 오픈 첫날 오후 11시까지 ‘누구에게 넘겨야 하나’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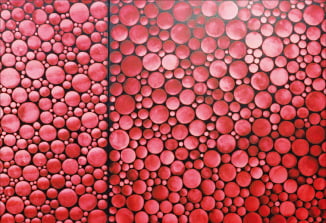
‘애매한 작품’을 들고나온 갤러리들은 이번 페어에서 쓴맛을 봐야 했다. 작가 이름값에 비해 작품의 평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실적이 더욱 좋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국내 갤러리 대표는 “불경기에 오히려 고가 작품이 잘 팔린다”며 “예술시장 전망이 불안하니 확실한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에만 고객들이 지갑을 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능성 보여준 ‘K아트’
이번 아트바젤 홍콩에서도 국내 작가들의 인기는 두드러졌다. 조현화랑에서 내놓은 이배의 조각과 회화를 포함한 세 점은 사전 판매만으로 한 인도 컬렉터에게 모두 팔렸다. 학고재가 가지고 나온 정영주의 작품 두 점도 오픈과 동시에 완판됐다. 우찬규 학고재 회장은 “지난해 홍콩에서도 가지고 나온 정영주 작품을 오픈일에 모두 넘겼다”며 “올해 해외 시장에서 정영주가 가진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국 작가 파워’를 가장 잘 보여준 곳은 국제갤러리다. 국제갤러리는 사전 판매와 VIP 오픈일에 김윤신의 작품 네 점, 이희준의 작품 네 점을 포함해 강서경과 이기봉 등 한국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모두 판매했다. 엄선된 작가들의 설치작을 선보이는 인카운터스 섹션에 내놓은 양혜규의 작품까지 7만유로(약 1억원)에 팔며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대형 설치작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주인을 찾아갔다.
아트바젤 홍콩 개최 기간에 돋보인 한국 작가들의 약진에 세계 미술계의 눈은 서울을 향하고 있다. 한 갤러리스트는 “국내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오는 9월 코엑스에서 개최될 한국국제아트페어(KIAF)-프리즈 서울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홍콩=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