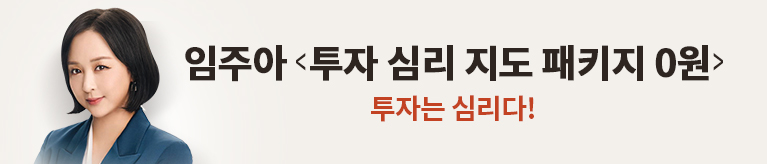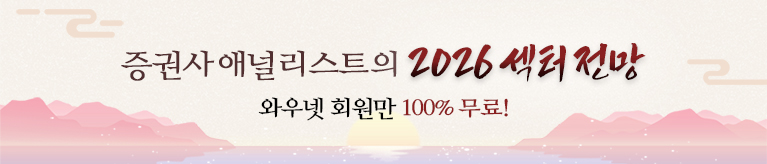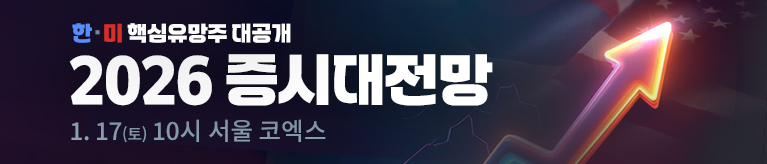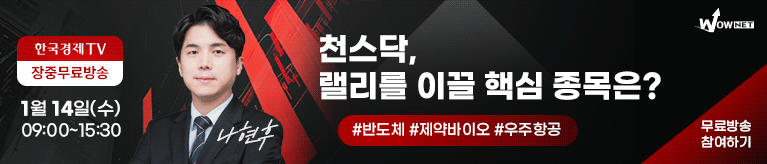오는 14일은 유튜브가 탄생한 지 19주년 되는 날이다. 유튜브는 페이팔의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 스티브 첸, 조드 카림이 2005년 2월 14일 유튜브닷컴 도메인을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동영상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원대한 창업 포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2004년 2월 미국 CBS에서 생중계한 슈퍼볼의 하프타임 공연에서 재닛 잭슨의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 카림이 뒤늦게 이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동영상을 웹브라우저에서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로 하고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메인 등록 2개월 뒤인 4월 23일 유튜브 역사상 첫 번째 영상인 ‘동물원의 나(Me at the zoo)’가 업로드됐다. 카림이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 코끼리 우리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담은 19초짜리 영상이다. 조회수가 3억 회에 이른다. 2005년 12월 15일 유튜브 공식 법인이 출범했다.
오는 14일은 유튜브가 탄생한 지 19주년 되는 날이다. 유튜브는 페이팔의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 스티브 첸, 조드 카림이 2005년 2월 14일 유튜브닷컴 도메인을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동영상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원대한 창업 포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2004년 2월 미국 CBS에서 생중계한 슈퍼볼의 하프타임 공연에서 재닛 잭슨의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 카림이 뒤늦게 이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동영상을 웹브라우저에서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로 하고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메인 등록 2개월 뒤인 4월 23일 유튜브 역사상 첫 번째 영상인 ‘동물원의 나(Me at the zoo)’가 업로드됐다. 카림이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 코끼리 우리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담은 19초짜리 영상이다. 조회수가 3억 회에 이른다. 2005년 12월 15일 유튜브 공식 법인이 출범했다. 한국서도 카톡 제치고 1위로
 유튜브가 처음부터 ‘꽃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동영상을 손쉽게 올리고 볼 수 있어 인기를 끌었지만, 수익원은 없었다. 텍스트와 사진보다 동영상의 트래픽이 수십~수백 배는 높았던 탓에 운영비도 어마어마했다. 설립 이듬해인 2006년 11월 구글이 유튜브를 16억5000만달러(약 2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수익 모델이 없는 데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의 저작권 문제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탓에 ‘구글의 실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인수 4년 차인 2009년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0년 흑자로 돌아선 뒤 구글의 주력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튜브가 처음부터 ‘꽃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동영상을 손쉽게 올리고 볼 수 있어 인기를 끌었지만, 수익원은 없었다. 텍스트와 사진보다 동영상의 트래픽이 수십~수백 배는 높았던 탓에 운영비도 어마어마했다. 설립 이듬해인 2006년 11월 구글이 유튜브를 16억5000만달러(약 2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수익 모델이 없는 데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의 저작권 문제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탓에 ‘구글의 실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인수 4년 차인 2009년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0년 흑자로 돌아선 뒤 구글의 주력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유튜브의 성공 요인은 복합적이다. 모바일 네트워크의 발전과 어디서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의 보급, 끊임없이 입맛에 맞는 영상을 제공해주는 알고리즘의 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광고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는 생태계도 유튜브의 경쟁력이다. 과거 소수의 방송국이 독점했던 영상을 제작하고 확산할 수 있는 특권을 무너뜨렸다. 누구든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으면 삽시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
국내 업체 역차별 고려해야
현재 유튜브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 정보 검색부터 취미 생활까지 모든 일이 유튜브에서 이뤄진다. 국내에서도 ‘철옹성’ 같았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치고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위로 올라섰다.국내에도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판도라TV, 엠엔캐스트, 다음TV팟과 같은 서비스들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붐을 타고 2000년대 중후반 우후죽순 등장했다. 이 가운데 판도라TV는 유튜브보다 1년 이른 2004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튜브보다 먼저 창작자와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업체들이 밀려난 이유 중 하나는 정부 규제다. 2009년 7월 ‘저작권법 삼진 아웃제’가 시행되면서 불법 동영상이 올라가면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국내 플랫폼은 저작권 영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반면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는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다. 국내 이용자들은 유튜브로 발길을 돌렸다. 2008년 42%였던 판도라TV의 점유율은 2013년 4%까지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유튜브는 2%에서 74%로 뛰었다. 판도라TV는 결국 작년 1월 31일 영상 서비스를 종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우려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 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한다는 게 골자다. 선의의 규제가 업계 몰락으로 이어진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