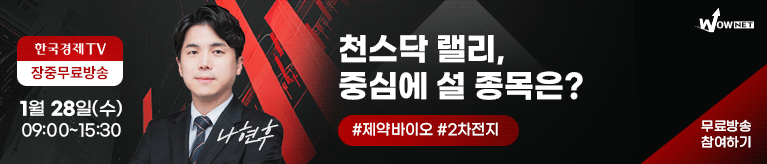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검사 시절부터 두터운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 22대 총선을 위해 의기투합한 지 불과 4주 만에 파열음을 내는 것에 여권도 썩 당황한 모습이다.
예고도 없이 폭발한 당정 갈등에 여권 관계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의 당협위원장이 일정도 취소하고 '두문불출'을 택했다. 원외나 당내 비주류 일각에서만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와 한 위원장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 대표도 퇴출당한다."(홍준표 대구시장), "한 위원장의 사퇴에 반대한다. 민주당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한 위원장을 우리 손으로 쳐낸다면 가장 기쁜 건 민주당이다."(태영호 의원) 등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울러 뒷말 또한 무성하다. "친윤 의원들의 이간질이다", "누군가 중간에서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터질 게 터진 것, 참아 왔던 불만이 폭발한 것일 뿐이다"는 등의 이야기들이다.
◆단순 이간질·약속 대련 vs 꾹꾹 눌러온 불만 폭발

이철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터진 당정 갈등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나 당무 개입 논란에 관해 묻는 말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권 주요 관계자들이 입을 꾹 닫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갈등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에게 힘이 쏠리자 친윤 의원들이 이간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함께 나오면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위원장에 대한 친윤 의원들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메신저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당내에서 분란을 만들었다"며 '이간질론'이 나왔다. "약속 대련이라고 믿고 싶다"는 의원도 있었다.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해당 행위이므로 심사숙고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그동안 꾹꾹 눌러온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총선 직전'이라는 시점과 만나면서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실제로 그간 여권 인사들의 소위 '김건희 리스크'를 대하는 온도는 공식 언어와 비공식 언어에서 큰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부인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입에 올리는 이들은 말 그대로 당내 '비주류' 뿐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권 관계자 누구나 '영부인 리스크'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수의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나 여권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22대 총선 전망에 관해 물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답변 중에 하나도 바로 여사 리스크였다. 여사 리스크가 커지면 총선이 불리할 것이라는 뻔한 예측 말이다.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실제 문제가 없어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영부인 리스크인데...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좋게 봐도 국민감정에는 맞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주요 관계자)
"디올백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정확한 경위도 모른다. 경위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
과거 두 차례 '연판장 사태' 때와는 다르게 친윤계 의원들의 '여론몰이'에 당내 호응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한다.
◆이러나저러나…"봉합 안 되면 다 죽는다"
경위야 어찌 됐든 '어떻게든 봉합해야 한다'는 게 여권 중론이다. 갈등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든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소통 과정의 오해라고 할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일들이 아닐까"라며 "두 분이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또 해본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현재 사태에 대해 "대전제는 한동훈 체제로 총선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봉합 안 되면 다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다른 수도원 당협위원장들의 반응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