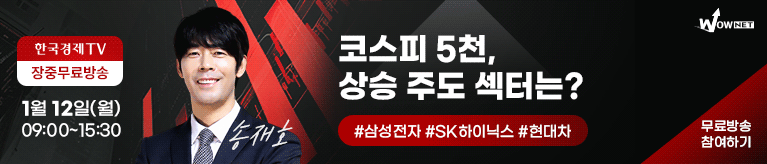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일생에서 2008년은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스페이스X 로켓 발사가 세 차례나 실패하면서 테슬라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급전을 구하러 지인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그로부터 2년 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2010년 테슬라가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것이다. 2억6600만달러를 수혈받은 덕분에 머스크는 2012년 피에몬트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의 첫 번째 양산형 전기차인 ‘모델S’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천문학적이다.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일생에서 2008년은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스페이스X 로켓 발사가 세 차례나 실패하면서 테슬라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급전을 구하러 지인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그로부터 2년 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2010년 테슬라가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것이다. 2억6600만달러를 수혈받은 덕분에 머스크는 2012년 피에몬트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의 첫 번째 양산형 전기차인 ‘모델S’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천문학적이다.월터 아이작슨의 머스크 전기는 2008~2010년 시기를 광기 어린 천재의 집요한 열정으로 묘사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의 설명은 진실의 절반만 보여준 것일 수 있다. 테슬라와 머스크를 구원한 건 거대한 돈의 흐름이었다. 미 중앙은행(Fed)은 2010년 불과 몇 개월 만에 무려 6000억달러를 쏟아부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불린 폴 볼커 Fed 의장 이후 비교적 꾸준히 유지했던 고금리 기조가 뒤집히면서 ‘이지 머니(easy money)’ 시대가 열렸다.
미국의 초당적 국가경영법
 이지 머니는 본능적으로 투자 대상을 찾는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위험 자산으로 달러가 흘러갔다. 미래 산업을 창출할 능력을 보여 준 빅테크들이 증권시장에 입성하자 글로벌 자금이 월가로 유입됐다. 월가는 다시 한번 세계 금융 패권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고, 세계의 돈을 끌어들여 미국의 성장 엔진에 기름을 부었다.
이지 머니는 본능적으로 투자 대상을 찾는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위험 자산으로 달러가 흘러갔다. 미래 산업을 창출할 능력을 보여 준 빅테크들이 증권시장에 입성하자 글로벌 자금이 월가로 유입됐다. 월가는 다시 한번 세계 금융 패권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고, 세계의 돈을 끌어들여 미국의 성장 엔진에 기름을 부었다.2차 세계대전으로 고립주의를 끝낸 이후 미국의 성장 공식은 한결같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지향점은 동일하다. 세계의 자금으로 미국을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한때 미국 재정 수입의 80%가 관세에서 나왔을 정도다.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그리는 미국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이다.
中은 세계 최대 디벨로퍼
중국 공산당도 미국의 힘을 알았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최대한 부풀려 남의 돈을 끌어올 수 있어야 했다. 중국 공산당이 전가의 보도로 삼은 건 부동산과 인구다. 14억 인구 중 절반만 중산층이 돼도 일본의 몇 배나 되는 시장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얘기가 있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공산당 조직은 땅을 개발해 그 돈으로 기업을 키웠다. 특히 수입 대체 산업에 집중했다. 화웨이, BYD 등에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이 있었을 것이란 건 불문가지다.결국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요체는 돈이다. 기업을 키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국가의 승패를 가른다. 우리는 어떤가. 미국처럼 달러 패권국도 아니고, 중국처럼 인구와 시장이 크지도 않다. 미래 산업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한단 말인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논쟁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한국의 자본시장은 테마주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 기업들이 알아서 돈 벌어 남는 돈을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당장의 생존이 급한 데다 창업 2, 3세는 징벌에 가까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야 할 판이다.
최근 상속세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국가에 무조건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얼마 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가기술투자회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를 위한 재원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스웨덴이 2005년에 상속세를 자본 이득세로 바꾸고, 최근엔 영국이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