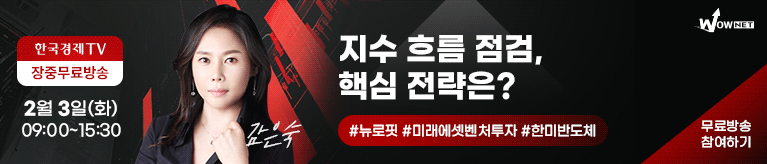"앱 이용 수수료가 음식값의 10%가 넘어요. 배달료도 손님이 내시는 것 외에 저희도 따로 더 내거든요."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의 변(辯)이다. 이 식당 메뉴판 속 감자탕의 가격은 대·중·소 크기에 따라 각각 3만원, 4만원, 4만8000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주문하면 3만2000원, 4만2000원, 5만원으로 2000원씩 비싸다. 여기에 주문금액과 거리에 따라 최대 3500원의 배달비가 따로 더 붙는다.
해당 한식당 업주는 11일 한경닷컴에 "앱 이용 수수료가 부담돼 그렇다"고 답했다. 업주는 "대신 당면, 수제비와 같은 사리가 '비조리' 상태로 나가는데, 국물의 양을 매장보다 넉넉히 드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매장 내 시식과 배달 가격이 상이한 건 이곳뿐만이 아니다.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 전문점은 햄버거 세트 메뉴를 배달 주문하면 매장 가격보다 1400원씩 더 받고 있었다. 경기 군포시의 한 한식당에서 판매하는 아귀탕도 배달 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8000원 더 비싸게 팔고 있었다.
이러한 '같은 메뉴 다른 가격' 현상은 곳곳에서 우후죽순 생겨났다. 지난해 2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 1061개 메뉴의 배달 앱 가격을 조사한 결과, 58.8%에 해당하는 20개 음식점에서 음식의 매장 가격과 배달 앱 내 가격이 달랐다. 1061개 메뉴 중 529개(49.8%)는 배달 앱에서의 음식 가격이 매장보다 비쌌다.
또 지난달 13일 경기도청이 도내 108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인 426개 업체에서 가격 차이를 보였다. 가격이 다른 업체 중 91%는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더 비쌌다.

동일한 음식임에도 가격이 제각각인 식당이 전국적으로 늘어난 탓에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주 3회씩 배달 앱을 이용했다는 20대 성모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홀 운영 비용이 절약되는데 배달 음식이 더 비쌀 이유가 있나'라는 의문이 든다"며 "배달비도 너무 올라 앱을 켜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푸념했다. 20대 김모 씨도 "매장 가격과 배달 앱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웬만하면 전화로 포장 주문을 한다"며 "요즘엔 음식 주문 전에 어떤 경로가 가장 저렴한지 꼭 검색해본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업주들은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이모 씨는 "배달 메뉴의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책정해서 판매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손해"라며 "배달 앱이 업주에게도 배달비를 따로 받고 있어 부담"이라고 했다. 이어 "마진이 적더라도 다른 가게들이 모두 배달하니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속 소비자들의 배달 주문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주요 배달 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결제추정금액과 결제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배달 주문 결제액 추정치는 1조5800억원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달 앱 결제자 수 역시 1910만명으로 2020년 12월(1875만명)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장과 배달 앱 가격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며 "배달 앱에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어차피 소비자들은 손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비한다"면서 "소비자가 음식 구매 경험 속에서 속았다고 느끼면 지갑을 닫게 된다"며 "결국 외식업 종사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손해"라고 강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