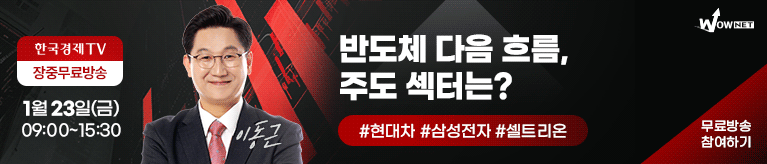“오 친구들이여, 이런 소리가 아니오! 좀 더 즐겁고 환희에 찬 노래를 부릅시다!”
귀가 들리지 않는 막막한 현실에도 인류애와 평화를 외쳤던 베토벤은 마지막 교향곡 ‘합창’에 이런 문구를 써 넣었다. 덕분에 합창은 연말이면 세계 곳곳에서 연주되는 ‘단골’ 레퍼토리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주 국내 양대 오케스트라인 KBS교향악단(20일)과 서울시립교향악단(21일)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연이어 합창을 선보였다. 연말 분위기에 딱 들어맞는 선곡으로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지만, 연주 자체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빠르고 강렬한 서울시향의 ‘합창’
서울시향의 공연은 내년부터 정식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얍 판 츠베덴이 이끌었다. 이들이 빚어낸 합창은 첫 소절부터 청중을 놀라게 했다. 빠른 속도 때문이었다. 전 악장 완주에 통상 70~75분가량 걸리는 이 교향곡을 60분 만에 끝내버렸으니.합창은 ‘적정 템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작품이다. 그래서 감상 포인트는 속도 자체보다는 지휘자가 설정한 템포를 악단이 얼마나 잘 따랐는지, 그래서 얼마나 완성도 높은 연주를 보여줬는지에 있다.
평론가들과 애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츠베덴의 명료한 지휘와 이에 반응하는 악단의 호흡은 좋았다. 다만 합창은 인류애, 평화 등 베토벤의 정신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구조적 완결성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이날 연주에선 이를 위한 ‘여유’가 빠진 모양새였다. 1악장 도입부부터 그랬다. 이 구간에선 모호한 화성과 거의 들리지 않는 호른의 울림,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현악기 소리가 켜켜이 층을 이루면서 일순간 터뜨리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핵심인데, 매력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
냉소적이면서도 강렬한 2악장, 숭고한 서정이 담긴 3악장을 거쳐 등장하는 ‘백미’ 4악장까지 소리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현악기군은 안정적인 기교와 앙상블로 지휘에 반응했다. 서울시향의 탄탄한 기본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합창단(국립합창단·고양시립합창단)과 성악가(서선영·양송미·김우경·박주성)들은 강렬한 목소리로 베토벤의 메시지를 또렷하게 들려줬다.

온건한 KBS의 ‘합창’
KBS교향악단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한 서울시향과는 다른 분위기의 합창을 선보였다. 피에타리 잉키넨은 안정적인 템포로 온건한 해석을 들려줬다. 하지만 ‘단단하고 꽉 찬 느낌이 안 들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군데군데 앙상블이 틀어지기도 했다.‘고요 속의 긴장’을 살려내는 게 숙제인 1악장 도입부를 잉키넨은 섬세한 톤으로 그려나갔다. 잉키넨은 ‘지나치게 빠르지 않게’란 악보의 템포 지시어를 잘 따랐다. 2악장에선 몰아치듯 경쾌한 템포로 얼굴을 바꿨다. 하지만 리듬이 뭉개지듯이 들리면서 활력이 반감됐다. 이 둔탁함을 보완해준 건 팀파니의 각진 사운드였다. 그 덕분에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고, 3악장에선 삐걱거리던 파트 간 앙상블도 살아났다.
그렇게 폭풍 같은 4악장이 열리자, 성악가들도 얼굴을 드러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더블베이스의 묵직한 ‘환희의 송가’ 선율에 현악기 소리가 더해지며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노래가 나오는 대목에서 잉키넨은 성악가의 목소리가 악단의 연주에 묻히지 않도록 살폈다. 바리톤의 레치타티보(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창법), 그리고 솔로 성악가들과 합창단의 웅장한 응답까지. 기악곡에서 성악곡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파격적인 구조와 웅장한 사운드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역시 베토벤’이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4악장에선 오케스트라의 호흡이 성악가(홍혜승·김정민·박승주·최기돈)들의 중창과 이따금 어긋났다. 그럼에도 잉키넨의 빠른 판단 덕분에 괜찮게 조율됐다.
김수현/최다은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