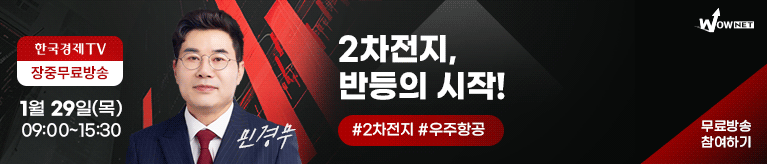변변한 찬이 없어도 짭짜름한 조미김 한 봉지면 밥 한 공기 뚝딱이다. 식당에서 종종 나오는 마른 김과 참기름 간장은 또 어떤가. 밥을 싸 찍어 먹는 맛과 재미에 주메뉴보다 더 손이 간다. 밥을 부르는 김의 마력 앞에 ‘탄수화물 줄여보자’는 다짐은 헛일이 된다.
변변한 찬이 없어도 짭짜름한 조미김 한 봉지면 밥 한 공기 뚝딱이다. 식당에서 종종 나오는 마른 김과 참기름 간장은 또 어떤가. 밥을 싸 찍어 먹는 맛과 재미에 주메뉴보다 더 손이 간다. 밥을 부르는 김의 마력 앞에 ‘탄수화물 줄여보자’는 다짐은 헛일이 된다.문헌에 따르면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김을 먹었다. 고려 후기 승려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그리 나온다. 명나라 <본초강목>에도 ‘신라의 깊은 바닷속에서 채취하는데,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들어가 따온다’는 내용이 있다. 본격적인 김 양식은 병자호란 당시 의병장을 지낸 김여익이 시작했다는 게 정설이다. 1640년 전남 광양 태인도로 이주해온 그가 해변에 밀려온 참나무 가지에 김이 붙은 것을 본 뒤 양식에 나섰다. 해의(海衣)나 해태(海苔)로 불리던 이 해조류의 명칭을 김여익의 성을 좇아 김으로 명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밤나뭇가지나 섶발 등에 김을 붙이는 초기 양식법은 이후 200여 년 이어졌다. 그러다 1840년대 대나무 쪽으로 발을 엮어 한쪽은 바닥에 고정하고 반대쪽은 물에 뜨도록 한 떼밭 양식이 개발됐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은 조수간만의 차에 영향받지 않는 부유식 양식법이 확산한 1970년대 들어서다.
현재 전국 김 양식 면적은 약 635㎢로 여의도(2.9㎢)의 218배나 된다. 진도·해남·고흥·완도·신안 등 전남 지역 생산량이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맑은 날 항공기에서 내려다보는 남해안 김 양식장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2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는데, 한국 김 인기와 맞물려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수출이 올해 1조원(약 7억7000만달러)을 돌파했다. 작년(6억5000만달러)보다 18%나 늘었다. 김 생산자와 가공·수출기업의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등 기존 시장뿐 아니라 중동 남미 등 신시장 개척 성과도 고무적이다. 오늘도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김 양식과 수확에 여념이 없는 바다의 수출 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류시훈 논설위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