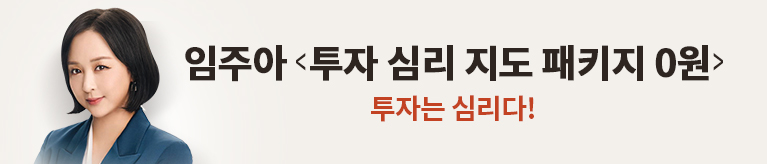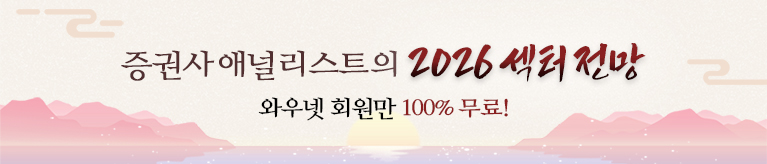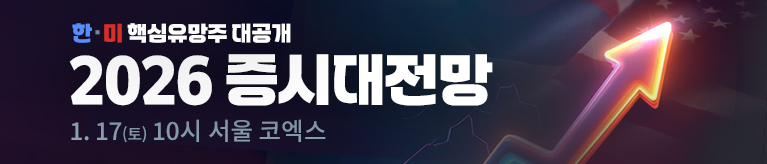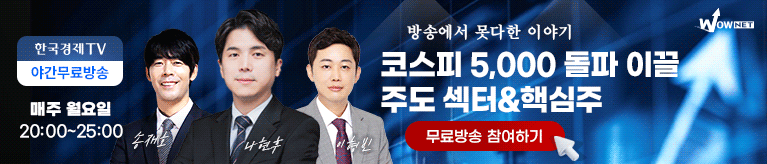○초대형 데이터센터 잇따라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달 생성 인공지능(AI)의 브레인 센터 역할을 할 초대형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본격 가동한다. 당초 계획한 완공 시점보다 한 달 빠르다. 각 세종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60만 유닛 이상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총투자 규모만 6500억원에 달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달 생성 인공지능(AI)의 브레인 센터 역할을 할 초대형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본격 가동한다. 당초 계획한 완공 시점보다 한 달 빠르다. 각 세종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60만 유닛 이상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총투자 규모만 6500억원에 달한다.네이버 측은 “국내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업 자체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세종의 저장용량은 65엑사바이트(1엑사바이트는 약 10억 기가바이트)에 달한다. 2013년 지은 자체 데이터센터 ‘각 춘천’은 12엑사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었다.
경쟁사 카카오의 주요 현안도 자체 데이터센터 건립이다. 카카오는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경기 안산에 12만 유닛 이상 서버를 보관할 수 있는 첫 자체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이곳은 6엑사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경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자체 데이터센터 준비에 더 신경 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회사는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추고 있지 않아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
NHN도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세계 10위급 AI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이달 완공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AI 확산에 적극 대응
업계에선 ICT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자체 데이터센터를 세우는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자체 데이터센터는 땅값을 제외하고 건설에만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대용량 서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정보기술(IT) 장비 구동뿐 아니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냉각장치에도 대규모 전력이 소요된다.이런 이유로 그동안은 외부 데이터센터를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내 IT 기업 대부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 서버를 이용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자체 데이터센터를 늘리는 핵심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확산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증가가 첫 손에 꼽힌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AI와 IoT 활용이 늘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이를 감당할 자체 데이터센터가 절실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AI 알고리즘은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정교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한다.
리서치회사 국제데이터그룹(IDG)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소비된 데이터의 총량은 약 10만엑사바이트다. 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