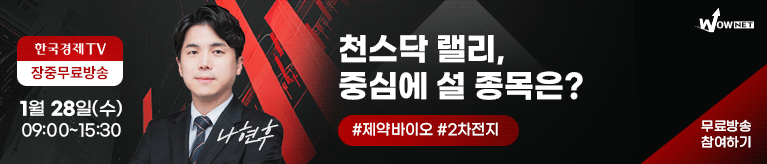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를 개최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기했다. 지난해 9월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헌법에도 명기해 핵폭주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물론 기존 북한 헌법 서문에도 ‘핵보유국’이 명기돼 있다. 하지만 이번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생존권과 발전권의 담보와 전쟁의 억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사수’에 두고, 이를 위해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핵무기 생산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핵타격 수단의 다종화 실현 및 실전 배비(配備) 사업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를 개최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기했다. 지난해 9월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헌법에도 명기해 핵폭주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물론 기존 북한 헌법 서문에도 ‘핵보유국’이 명기돼 있다. 하지만 이번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생존권과 발전권의 담보와 전쟁의 억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사수’에 두고, 이를 위해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핵무기 생산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핵타격 수단의 다종화 실현 및 실전 배비(配備) 사업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우리가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을 위협적으로 보는 까닭은 김정은 핵 교리(nuclear doctrine)의 악성 진화 때문이다. 즉 억제에 초점을 둔 2013년의 ‘자위적 핵보유법’이 사용에 중점을 둔 2022년 핵무력정책법으로 진화해 핵무력을 한반도를 북한 통치 체제로 통일하는 영토완정(領土完整)의 수단으로 악용하겠다는 마각을 다시 드러냈다. 김정은의 2022년 영토완정은 김일성의 1949년 국토완정과 같은 맥락이다. 즉 김일성의 국토완정 산물이 6·25 남침전쟁이었던 것처럼, 김정은의 영토완정은 핵무력을 앞세운 흡수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북한은 핵무력정책법 제정 후 핵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치중했다. 즉 모의 전술핵 타격훈련 실시, 800m 상공 전술핵 폭발훈련, 핵탄두 모의실험, 핵어뢰 폭발시험 등이다. 이 훈련은 재래식 무기와 전술핵을 결합한 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다. NCG는 미국 핵우산정보 공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 한국 참여 등을 통해 기존의 확장억제 전략을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이 노골적 핵위협을 공언한 현실에서 NCG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한계의 근원은 북핵 공격을 상대하는 미국의 ‘반격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따라서 한계 극복을 위해 NCG의 상시적 운영으로 인적·조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반격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신뢰 구축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위를 NCG에만 의존하는 것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 이 결함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NCG의 기본구조는 평양이 서울을 공격하면 워싱턴이 평양을 공격해 한국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은 아직 유효하고 베이징이 평양의 후견 역할을 자임하는 상황에서 NCG는 한계가 있다. 즉 베이징이 평양 보호를 위해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베이징이 서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NCG 구조 재편 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NCG의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의 핵공유로 격상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최악의 북핵 상황에 대비해 독자 핵개발 능력을 갖출 ‘플랜 B’가 필요하다. 플랜 B는 중국이 북핵 폐기의 실제적 행동을 추동할 기제라는 점에서도 유용한 전략이다. 그리고 플랜 B의 위험을 줄일 방안의 하나로 한·미·일 핵개발 연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핵 공격의 위협을 막고 한반도의 건강한 평화를 회복하며 북한판 영토완정도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