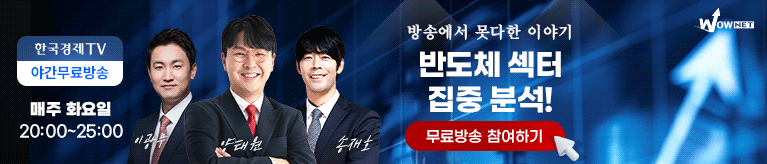21세기의 첫해인 2000년. 프랑스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단발 계약직 오디션을 거쳐 종신단원이 됐을 때 일이다. 한국을 떠난 지 반년 만에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그해 8월 고국의 국립발레단 정기 공연에 초청받았다. 국내 초연되는 장 크리스토프 마요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 역을 맡았다. 꿈에 그리던 로미오 역이었지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처음엔 영상만으로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연습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막상 연습을 시작하자 신선한 충격의 연속이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등장인물에 대한 안무가의 재해석이다. 원작에서도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클래식 발레 버전에선 크게 부각되지 않는 신부 ‘로렌스’가 극의 전반을 이끌어가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줄리엣의 엄마는 강인하고 모성이 넘쳐 로미오와 줄리엣의 존재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안무적 기법은 또 어떤가. 마요의 안무는 거의 모든 동작이 마치 인간의 원초적 감정에서 표출되는 움직임과 그 자체를 옮겨놓은 듯하다. 춤을 추는 무용수 입장에선 극 속의 상황과 감정에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마술과 같은 힘을 갖는다. 이런 점은 클래식 발레 작품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다. 마요는 무용수와 관객이 극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한계를 명확하게 잡아내는 한편 그 표현과 이해의 경계를 깨부수고자 한 것 같다.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 역시 그랬다. 아무리 극 중이어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키스’라는 행위를 무대라는 열린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적어도 나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안무가는 이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안무에 활용했다. 2000년 당시엔 나를 비롯한 한국 관객들에게 꽤 큰 문화적 충격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하나는 ‘이 장면을 직접 보는 관객이 혹시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던 것. 또 하나는 ‘언젠가, 누군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우린 평생 숨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면 안 되는 부끄러운 일처럼 여길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실제 키스신에선 리허설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장면을 네 차례의 공연으로 모두 지켜본 나의 아내 입장에선 그때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뒤늦게 미안한 감정마저 든다.
안무가 마요는 작품의 전체적 흐름에 발레 기법을 유지하면서도 특이하게 ‘영화적인 기법’을 풀어낸다. 예를 들어 2막에 티볼트가 로미오의 절친한 친구인 머큐시오를 죽게 하는 장면과 이후 그에 대한 복수로 로미오가 티볼트의 목을 스카프로 감아 죽이는 장면이 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마요는 영화적 기법인 ‘슬로 모션’을 활용해 극의 집중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무용수들도 그렇다. 그 상황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당시 티볼트 역을 맡았던 동료는 “자신이 정말 나(로미오)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무대에서 춤추다가 죽기’라는 일생일대의 소원을 이룰 뻔했다는 농담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무용수로서 한 가지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주인공 둘의 심리 상태를 두 사람의 신체와 특정 신체 부위 한 곳(손)을 통해 전달한다는 점이었다.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 그 표현의 확장성이 그렇게 다양하고, 디테일하고, 거대할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세상엔 수많은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고, 이들 역시 각각의 매력과 감동이 넘쳐흐른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들이 왜 그렇게 ‘마요 버전’ 로미오와 줄리엣만큼은 꼭 춰보고 싶어 하는지는 작품을 직접 보면 알 수 있다.
 영원토록 무대 위의 그 작품 속에 머무르며 춤을 추고자 했던, 강렬했던 나의 마음은 어느덧 50세가 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세계 최고의 안무가이자 천재적인 장 크리스토프 마요, 그의 삶과 작품의 모든 장면에 경의를 표하고 싶은 날이다.
영원토록 무대 위의 그 작품 속에 머무르며 춤을 추고자 했던, 강렬했던 나의 마음은 어느덧 50세가 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세계 최고의 안무가이자 천재적인 장 크리스토프 마요, 그의 삶과 작품의 모든 장면에 경의를 표하고 싶은 날이다.발레리노·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