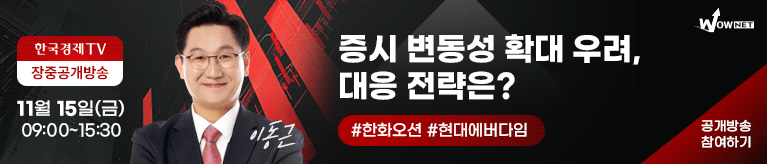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50원 선을 뚫고 연고점을 경신했다. ‘3고’(고환율·고금리·고유가) 외에 고공행진하는 다른 물가까지 보면 ‘4고(高)’의 높은 격랑이 다가오는 분위기다.
원화 가치가 올해 최저로 떨어진 것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Fed 내 매파 인사의 언급에 달러 인덱스는 10개월 새 최고치로 치솟았다. Fed의 긴축 기조에 금융시장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강달러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아 고환율이 장기화할 수 있다.
환율은 증시와 함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면서 미래 경제 여건을 선반영한다. 최근의 환율 급변동을 더 유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다. 이전처럼 고환율이 수출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 상승-국내 물가 반영-소비 감소의 악순환 고리로 이어져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고환율이 경상수지 걱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고금리·고유가도 부담이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최소 2.25%포인트로 벌어진다. 부동산 ‘영끌 매수’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라는 우리 경제의 양대 잠재 뇌관이 언제든지 현안으로 부상할 판이다. 가뜩이나 경기 회복의 반전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투자 모두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도 “하반기 경제가 바닥을 다지면서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기존의 ‘상저하고’ 전망을 반복했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이해할 만하지만, 실제로 낙관론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금융시장에는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머물 수 있다는 L자형 장기 침체 우려가 적지 않다. 이 판에 7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 리스크’와 야당발 ‘사법 리스크’까지 겹쳐 살얼음판 경제에 경제 외적 요인까지 봐야 할 상황이다. 외환시장도, 주식시장도 경제의 펀더멘털과 미래 전망을 반영한다는 기본 원리에 다시 주목할 때다. 그러면 해법도 보인다. 가계와 기업보다 정부가 더 긴장할 때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