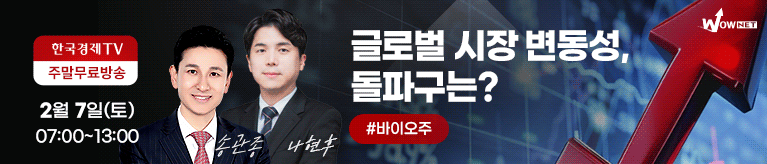<테스>와 <귀향>을 쓴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토머스 하디는 시인과 극작가로도 활동했다. 19세기 말 영국 사회의 인습, 편협한 종교인의 태도를 용감하게 공격하고, 남녀의 사랑을 성적인 면에서 대담하게 폭로한 작가로 유명하다. 1928년에 세상을 떠난 하디가 100년 전 사람임에도 그의 작품들이 마치 지금 옆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세상이 점점 더 교묘하게 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리라. <환상을 좇는 여인>은 1893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남성 작가인 하디가 여성의 심리묘사에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준다.
마치밀 부부는 웨섹스 위쪽 지방에 있는 해변 휴양도시 솔런트시에서 여름을 지내기로 한다. 영구 임대해 1년 내내 살던 독신 신사가 한 달간 자신의 집을 내주어 마치밀 부부와 세 자녀가 그곳에 묵게 된 것이다.
북부 지방의 번화한 도시에서 총기 제조업을 하는 마치밀과 부인 엘라는 겉으로 보면 다복하기 이를 데 없다. 엘라는 결혼할 당시 남편의 부유함이 좋았지만, 아이 셋을 낳은 지금은 남편을 우둔하고 고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남자 이름으로 시를 기고하는 여자
 엘라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존 아이비’라는 남자 이름으로 잡지에 시를 기고해왔다. 자신의 시가 유명 시인 로버트 트리위의 작품과 함께 실린 적이 있어 엘라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한 달살이를 하기로 한 집을 영구 임대한 사람이 트리위라는 사실을 안 엘라의 마음에 엄청난 파문이 인다.
엘라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존 아이비’라는 남자 이름으로 잡지에 시를 기고해왔다. 자신의 시가 유명 시인 로버트 트리위의 작품과 함께 실린 적이 있어 엘라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한 달살이를 하기로 한 집을 영구 임대한 사람이 트리위라는 사실을 안 엘라의 마음에 엄청난 파문이 인다.총기 제조업자인 남편을 경멸하는 여인이 꿈에 그리던 시인과 간접적으로 조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달 내내 트리위의 책과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으나 시인을 만나지 못한 엘라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를 잊지 못한다. 남편의 사업이 계속 번창하는 가운데 커다란 새집으로 이사했지만 마음이 텅 빈 엘라는 서정시나 비가를 쓰며 지낸다.
어느 날 잡지 최신호에서 트리위의 시를 발견한 엘라는 존 아이비라는 이름으로 축하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두 달 남짓 편지가 오고 간 즈음에 지인의 아우인 화가가 트리위와 함께 웨일스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엘라는 곧바로 두 사람을 초대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화가만 방문한다.
며칠 후 엘라는 신문에서 트리위의 자살 소식을 접한다. 최근 정열적인 시를 발표했는데, 한 잡지의 신랄한 비평감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트리위가 친구에게 남긴 편지가 실려 있었다. “만일 하나님이 날 몹시 아껴주는 여성을 보내주셨더라면 나는 내 생명을 더 연장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지도 모르겠네 … 찾을 수 없는 여인을 동경했다네 … 발견할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여인이 내 마지막 시집에 영감을 불어 넣었네 … 내 환상의 여인에 불과했으며 실제하는 여인은 아니네”
엘라는 그 편지를 읽고 슬픔과 괴로움에 휩싸여 “오, 만일 그가 나를 알기만 했더라면 …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줄 수 있었다면 … 그를 위해 어떤 수치나 비방도 달게 받고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겠다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었다면”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한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
엘라는 솔러트시 숙소 주인에게 트리위의 사진과 관 뚜껑이 덮이기 전에 머리카락을 좀 얻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심지어 엘라는 트리위의 무덤을 찾아가기까지 한다. 모든 의욕을 상실한 엘라는 넷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한다.몇 년 후 재혼을 앞둔 마치밀이 죽은 부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머리카락과 시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넷째 아이가 시인의 아이일 것으로 의심하며 소설은 끝난다.
이 소설은 바로 요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생하지만 엘라가 여성이라는 자격지심에 남자 이름으로 기고한 점,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마치밀이 넷째 아이에게 “넌 나와 상관없는 놈이다!”라고 외치는 마지막 부분에서 19세기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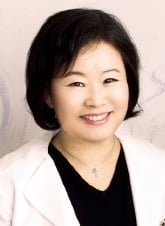 <환상을 좇는 여인> 에는 나이 들어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꿈과 비뚤어진 욕망, 가정과 세 아이의 엄마라는 현실, 둘 사이의 부조화가 지독하리만큼 명징하게 들어 있다. 환상 속 여자만 생각하다 죽음을 선택한 시인과 환상 속 시인을 그리다 현실을 외면한 엘라, 두 사람이 바라본 허공의 끝에는 위험만 도사리고 있었다.
<환상을 좇는 여인> 에는 나이 들어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꿈과 비뚤어진 욕망, 가정과 세 아이의 엄마라는 현실, 둘 사이의 부조화가 지독하리만큼 명징하게 들어 있다. 환상 속 여자만 생각하다 죽음을 선택한 시인과 환상 속 시인을 그리다 현실을 외면한 엘라, 두 사람이 바라본 허공의 끝에는 위험만 도사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