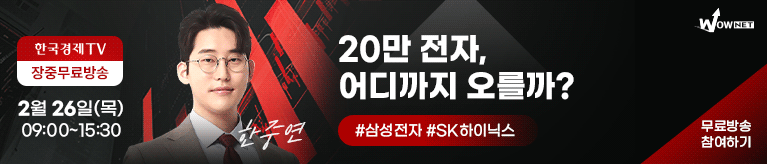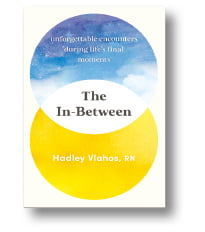 사람들이 좀처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 ‘죽음’의 세계다. 누구나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죽음의 세계는 가능한 한 늦게 가고 싶은 곳이다. 한편으로는 궁금하면서도 웬만해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경험의 집합체다.
사람들이 좀처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 ‘죽음’의 세계다. 누구나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죽음의 세계는 가능한 한 늦게 가고 싶은 곳이다. 한편으로는 궁금하면서도 웬만해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경험의 집합체다.그런데 최근 들어 죽음을 터부시하던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진다. 죽음과 삶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깨달음과 웰빙을 넘어 웰다잉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단어조차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 각도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점가에는 죽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책이 출간되고 있다.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최상위권 목록으로 치고 올라간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The In-Between)>의 인기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제 갓 서른을 넘은 호스피스 간호사이면서 소셜미디어 스타이기도 한 해들리 블라호스는 책을 통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순간에 대해 전한다.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집을 찾아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호스피스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가장 기억에 남는 열두 가지 장면을 소개하면서, 죽음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 분명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과정과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감정을 경쾌하면서도 희망차게 그려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호스피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 삶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면 현재의 순간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해들리 간호사(Nurse Hadley)’로 활동하는 저자는 언제나 밝고 유머러스하게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죽음과 친해진다.
저자는 신앙심이 깊은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자신의 신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19세에 미혼모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당했고, 자신과 아이를 스스로 돌보기 위해 간호학교에 입학했다. 그렇게 시작한 간호는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가치로 여겨졌고, 완화 치료와 호스피스는 소명처럼 다가왔다.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먼저 진솔하게 털어놓는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잊을 수 없는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발견한 기쁨과 지혜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성,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딸의 환영을 본 노인, 그리고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자신의 짧은 인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젊은 여성에 이르기까지, 죽음 앞에서 도리어 또렷해지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전한다.
“떠날 때 모두 가져갈 수 없잖아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세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저자가 만난 환자들은 종교, 신분, 가족 관계 등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거의 비슷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죽음 앞에 서면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왜 오늘도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
저자가 만난 환자들은 종교, 신분, 가족 관계 등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거의 비슷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죽음 앞에 서면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왜 오늘도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홍순철 BC에이전시 대표·북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