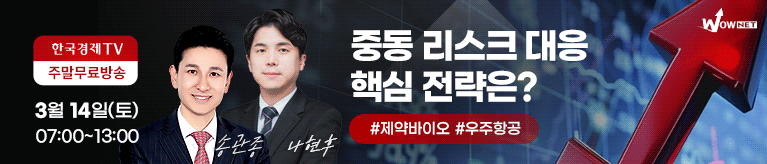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도 생성 인공지능(AI) 열풍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 증권사들의 반응은 냉정하다. 시작이 늦은 데다 투자 재원 면에서도 격차가 커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간극을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오픈AI의 ‘챗GPT’를 필두로 구글의 ‘바드’, 아마존웹서비스의 ‘베드록’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은 아직 이렇다 할 생성 AI 플랫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외엔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을 찾기 힘들다는 점도 국내 AI 생태계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 신기술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 얼마나 고도화될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오는 24일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한다. 카카오도 연말께 ‘KoGPT 2.0’(가칭)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픈AI가 ‘GPT-3’를 거쳐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GPT-4’를 올 3월 발표한 것처럼, 두 회사가 2년 전 내놨던 하이퍼클로바와 KoGPT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선보이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이해도, 한국어 능력 등에선 빅테크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 AI 기술과 관련한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며 “흐름을 바꾸려면 미국 빅테크엔 없는 뚜렷한 강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 글로벌 1,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AI 수혜주로 거론된다. AI 서비스가 대중화되면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해 D램값 폭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했음에도 올해 들어 SK하이닉스 주가가 53.60% 뛴 배경이다. 삼성전자 역시 같은 기간 주가가 30.56% 올랐다.
하지만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와는 처지가 다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은 D램, 낸드플래시 같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다. AI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서버에 상당량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AI 서버의 핵심칩인 GPU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우선주 포함)은 479조9801억원이다. 달러로 환산한 시가총액이 3639억달러로 엔비디아(1조449억달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주현/양병훈/김익환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