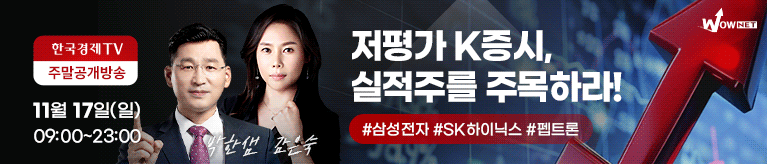지난해 수감 중인 한 정치인의 부모상 장례식이 SNS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고인의 빈소에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정치인의 화환이 늘어섰다. 실제 방문도 줄을 이었다. SNS에서는 “죄를 짓고 징역을 사는 사람의 가족상에 유력 정치인들이 바글바글하다니,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자식이 부모상을 치르는 데 아는 사람이 방문하는 것은 인간 된 도리”라는 주장이 격렬하게 부딪쳤다.
지난해 수감 중인 한 정치인의 부모상 장례식이 SNS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고인의 빈소에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정치인의 화환이 늘어섰다. 실제 방문도 줄을 이었다. SNS에서는 “죄를 짓고 징역을 사는 사람의 가족상에 유력 정치인들이 바글바글하다니,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자식이 부모상을 치르는 데 아는 사람이 방문하는 것은 인간 된 도리”라는 주장이 격렬하게 부딪쳤다.평소 SNS를 즐겨한다. 다만 논쟁에 끼어들지는 않고 지켜보는 편이다. 그때도 SNS 지인들이 벌이는 논쟁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다. 누구 편을 들든 ‘장례식’에 대한 해석이 다시 또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나’를 기준 삼아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장례식이 한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존중하는 자리였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에게는 대체로 가족 간의 내밀하고 신성한 행사였다.
회색분자인 나도 후자에 좀 더 가까웠다.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듯했다. 그런 모습을 친하지 않은 이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상상만으로도 꺼려졌다. 상대방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어르신들은 그런 상황일수록 손님을 맞으며 슬플 새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혹은 아직 사회경력이 짧아 인간관계 자체가 좁은 탓이라고도 했다.
공감이 가지 않았다. 정말로 안 당해봐서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변 Z세대가 대부분 “마음 같아선 회사에도 알리고 싶지 않다. 어차피 이직하면 안 볼 사람들인데 서로 불편해지지 않겠느냐”와 같은 반응을 보여준 것으로 짐작건대 단순히 경험 부족에서 나온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기준이 점점 바뀌고 있는 듯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범위가 넓었을 때는 오지랖을 주고받는 것이 너와 내가 서로에게 마음 쓰고 있다는 애정의 증명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범위가 좁아진 지금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하는 것만큼 대단한 ‘진상’이 없다.
그렇다면 문화보단 현실이 먼저 변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사회생활을 통해 넓은 우리를 갖추기에 MZ는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게 됐다. 사실 MZ라도 대기업·공기업 직장인과 공무원들은 기성세대와 비슷한 인식을 하는 편이다. 직업을 비롯한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형제자매의 숫자가 줄어들고 주거 형태도 달라졌다. 이렇게 현실은 우리가 좁아지는 방향으로 점점 더 쏠린다. 더 아랫세대는 더더욱 좁은 우리를 갖게 될 터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신은 없으나 10년 후 기성세대가 돼 겪을 세대 갈등이 벌써 두렵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