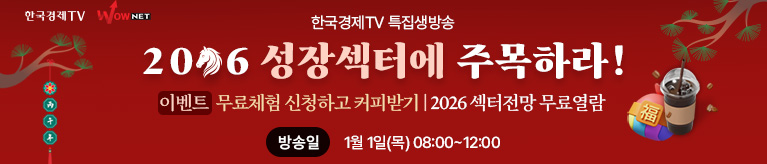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광명의 시대면서 암흑의 시대기도 했다. 희망의 봄이면서 절망의 겨울이었다.” 찰스 디킨스가 묘사한 18세기 중엽 영국의 풍경이다. 당시 영국은 분기점에 서 있었다. 경제적 고도성장과 함께 빈곤층이 급증했고, 현대적 정부 수립과 함께 식민지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도시는 빈곤과 범죄로 무질서해졌고, 정부 빚은 전쟁 비용 탓에 부도 직전까지 치솟았다. 빈민과 식민지를 수습하지 못하면 근대화의 에너지를 상실할 판이었다.
“광명의 시대면서 암흑의 시대기도 했다. 희망의 봄이면서 절망의 겨울이었다.” 찰스 디킨스가 묘사한 18세기 중엽 영국의 풍경이다. 당시 영국은 분기점에 서 있었다. 경제적 고도성장과 함께 빈곤층이 급증했고, 현대적 정부 수립과 함께 식민지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도시는 빈곤과 범죄로 무질서해졌고, 정부 빚은 전쟁 비용 탓에 부도 직전까지 치솟았다. 빈민과 식민지를 수습하지 못하면 근대화의 에너지를 상실할 판이었다.이때 근본적 차원에서 수습책을 제시한 사람이 애덤 스미스였다. 그는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졌다. 개인 본성과 사회 질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만민이 평화롭게 부를 증진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도덕감정론>은 첫 번째 질문의 답이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고도로 협동적인 삶을 산다. 따라서 인간 본성은 “타인의 행동과 감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인 공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공감이 없다면 문명도 없다. 이런 공감은 인생을 살아가며 내 마음속 판단 기준으로 자리를 잡는다. 스미스는 이를 ‘공평한 관찰자’라고 불렀다. 우리는 관찰자가 비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감이다. 관찰자가 칭찬하는 행위는 행해야 한다. 이것이 선행이다. 정의는 사회 차원에서 법치로, 선행은 시민적 덕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인간 본성에는 정의나 선행과 무관한 감정도 있다. 이기심과 질투가 그렇다. 스미스는 보통 사람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없앨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승화해야 한다. 여기서 시장이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기심과 질투를 경제성장이라는 모두의 이익으로 승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치, 덕성, 그리고 공정한 시장이 인간 본성과 사회 질서를 조화롭게 만든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국부론>에 나온다. 원제는 ‘Wealth of Nations’로 ‘민부론’ 또는 ‘만민의 부’ 정도가 맞다. 스미스는 인류 전체의 부를 늘릴 수 있는 원리에 주목했다. 바로 분업과 자본 축적이었다. 분업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인다. 자본 축적은 더 많은 노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 식민지 해법도 자명했다. 식민지 무역 독점은 분업과 축적에 해롭다. 더군다나 독점 유지에 사용하는 군사적 지출은 비생산적이다. 만민의 부를 위해 미국의 독립은 지지돼야 했다. 영국은 현명하게도 스미스의 길로 나아갔다. 정당의 책임 정치를 발전시켜 입법부 주도로 행정과 사법을 현대화했고, 시장의 경쟁 규칙도 개선했다. 언론 자유를 통해 시민적 덕성도 키웠다. 미국의 독립을 결국 인정했고, 무역은 이전보다 증가했다. 19세기 영국은 이런 식으로 정치·경제를 안정화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스미스가 2020년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놀랍다. 그가 다룬 쟁점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검수완박(법치), 내로남불(시민적 덕성), 이중노동시장(공정 경쟁), 노동개혁(분업), 부동산(자본 축적), 탈세계화(무역) 등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정신적 내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론도 분열했다. 스미스 같은 시대적 지성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물론 사회가 고도화한 만큼 한 명의 위인이 그런 책임을 떠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집단 지성 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스미스적 정당과 지성의 탄생을 기대해본다.